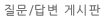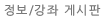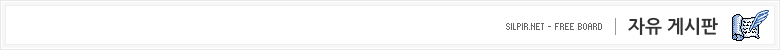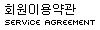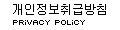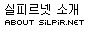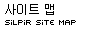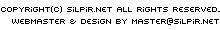최근 댓글
최근 댓글
{펌}덕수궁을 알아보자~
2004.02.20 08:13
1. 덕수궁(경운궁)의 역사
덕수궁(德壽宮)은 원래 왕궁이 아니고, 德宗(세조의 왕세자 추존)의 원자(元子) 월산대군(月山大君)의 사저(私邸)로서 서부 황하방(皇華坊 : 현 정동)에 위치하였다. 덕종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 아우인 해양대군(海陽大君)이 세조(世祖)의 제2세자가 되니 이분이 곧 예종(睿宗)이다. 예종이 승하한 후 덕종의 원자인 월산대군에게 왕위를 전하지 아니하고, 덕종의 둘째아들이요 예종의 양자인 성종(成宗)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월산대군은 왕의 친형으로 사저에 거처하였다. 성종 10년 12월에 월산대군이 서거한 후 다만 그 부인인 박씨만 연산군(燕山君) 시기까지 생존하여 있었다.
100여 년 후 임진왜란이 일어나 의주까지 피난했던 선조가 1년 반 만에 서울로 돌아왔으나, 경복(景福), 창덕(昌德), 창경(昌慶) 3궁과 종묘가 병란에 소실된 까닭에 머물 궁이 없었으므로 부득이 옛 월산대군 사택을 임시 행궁(行宮)으로 삼고 이름도 ‘시어소(時御所)’라 하였다. 처음에는 왕실 여러 사람들이 거처하기엔 좁았기 때문에 주변 여러 채의 민가들까지 포괄하여 이를 왕궁으로 개조, 목책(木柵)을 돌려 세웠고 선조 28년에는 길가에다 동문을 세웠다. 선조 40년(1607)에는 별전을 지어 생활공간이 다소 여유로와지기도 했지만, 전각 배치 등이 다소 산만한 느낌을 주었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궁궐과는 거리가 있었다. 선조는 생전에 정궁을 지어 돌아가려 하였으나, 나라의 형편이 여의치 않아 결국 이곳에서 승하하고 만다.
선조의 뒤를 이은 광해군은 1608년 이곳에서 즉위한 후 7년동안 왕궁으로 사용하였다. 1611년(광해군 3)에 창덕궁 복구공사가 마무리되고 그 해 10월에 창덕궁으로 옮겨가면서 행궁을 ‘경운궁(慶運宮)’이라 부르게 하였다. 하지만 광해군은 보름만에 다시 경운궁으로 이어(移御)하였고, 1615년 4월 창덕궁으로 이어하기까지 무려 3년 반이라는 기간을 더 이곳에서 머물렀다. 한편 1623년 반정에 성공한 인조가 경운궁 별당에서 즉위하였으나 곧 대비와 함께 창덕궁으로 이어함으로써 이후 경운궁은 궁궐이라기보다는 옛 행궁터로서, 즉조당(卽祚堂), 석어당(昔御堂)과 왕비의 궁방인 명례궁(明禮宮이라는 경운궁의 또다른 명칭이 여기서 유래) 건물이 몇 채 들어서 있는 정도였다. 그 후로 경운궁은 어려운 시절의 쓰라림을 안은 궁으로 회상되어 왔고, 영조를 비롯한 여러 왕들은 즉조당에서 자기성찰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다.
경운궁이 다시 왕이 임어하는 정식궁궐이 되는 것은 고종때 와서이다. 1895년 을미사변(乙未事變)으로 명성황후 민씨가 시해되고 친일적인 관료들과 일본의 압력이 가중되자 고종은 이듬해 2월 경복궁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俄館播遷).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면서 경복궁이나 창덕궁이 아니라 서양 각국의 공사관들이 밀집해 있는 정동의 경운궁으로 들어갈 생각을 가졌다. 따라서 왕태후와 왕태자비가 머물고 있던 경운궁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게 하는 한편 경복궁에 있던 명성왕후의 빈전과 역시 경복궁 집옥재에 보관되어 있던 선왕들의 초상화(御眞)를 옮겨오게 하였다.
그렇게 준비를 한 끝에 1897년(建陽 2년) 2월 고종과 왕태자는 경운궁으로 환궁하였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돌아온 것을 환궁이라고는 하지만 둘은 경계가 잇닿아 있었으므로 공간적으로는 위치를 조금 옮겨 앉은 데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로써 경운궁은 국왕이 임어하는 유일한 궁궐이 되었다. 경운궁으로 환궁한 뒤 8월 고종은 연호를 건양에서 광무(光武)로 고치고, 오늘날의 조선호텔 자리에 하늘에 제사지내는 원구단(圜丘壇)을 쌓았다. 10월에 가서는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정하고 그 이튿날 원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였다. 고종이 왕으로 경운궁에 임어하던 기간은 1897년부터 1907년 7월 19일, 일본이 헤이그 밀사 사건을 트집잡아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킬 때까지 10년 5개월이 된다.
경운궁이 궁궐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고종의 환궁 이후였다. ‘수리’라기보다는 ‘신축’이라 해야 할 정도의 경운궁 영건 공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많은 건물들이 세워진 것은 물론 1900년(광무 4) 1월 궁장(宮墻) 공사를 마치고, 1902년 2월에는 경복궁의 근정전, 창덕궁의 인정전에 견줄 만한 법전(法殿)인 중화전까지 완공됨으로써 경운궁은 이제 국왕이 임어하는 궁궐로서 필요한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앞서 1880년대 경운궁이 비어 있을 당시 그 터를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의 공사관 터로 잘라 주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운궁 부지는 외국 공사관부지와 섞이게 되었다. 따라서 경복궁처럼 정연한 공간구조를 갖추지는 못하였다. 가장 건물이 많았을 때의 경운궁은 크게 보아 정전인 중화전과 침전인 함령전 등이 있는 주요부와, 주요부 서측의 중명전 등이 있는 구역, 그리고 주요부 서북방의 선원전 등이 있는 구역 등 세 구역으로 나뉜다. 주요부는 대체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덕수궁’ 영역에 해당한다. 이곳에는 정전인 중화전을 비롯하여 침전인 함령전 등 제 이름을 가진 주요 건물들이 약 20여 채가 있었다. 중명전 구역은 오늘날 미국대사관저의 서편에 남아 있는 중명전과 그 주위의 예원학교 일대이다. 오늘날 그 구역에는 중명전만 남아 있고, 그나마 외따로 떨어져 있어 전혀 경운궁의 일부로 생각하기 어렵게 되어 버렸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확인된 바로는 중명전―본래 이름이 수옥헌(漱玉軒)이었던 듯하다― 이외에도 열 채 가량의 건물들이 어울려 하나의 영역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래는 더 많은 건물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뒤편으로 경향신문사 터까지 후원으로 이어졌으리라 짐작된다. 1901년에는 그곳에서 경희궁으로 새문안길을 건너가는 구름다리(虹橋)를 설치하기도 하였으나, 이 구름다리는 1908년 경에 헐렸다. 선원전 구역은 얼마 전까지 경기여고가 있던 터에서부터 영국대사관 북쪽 조선일보사 일대까지이다. 그곳 역시 지금은 덕수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되어 버렸지만 원래는 선왕들의 어진을 모셨던 선원전을 비롯하여 주요건물 다섯 채와 그 부속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서 하나의 영역을 형성하였다.
1904년(광무 8) 4월 경운궁에 큰 불이 났다. 침전인 함령전의 온돌을 수리하다 실화(失火)한 것이 바람을 타고 연속적으로 번지는 바람에 중화전, 즉조당, 석어당, 경효전 등 대부분의 건물과 거기에 비치되거나 소장되었던 집기와 문물들이 한꺼번에 사라지게 된 대화재였다. 고종은 화재가 날 때 함령전 옆의 다른 건물에 있었기에 겨우 화를 면했다. 그 날로 수옥헌으로 처소를 옮긴 고종은 전현직 대신들을 불러 러일전쟁으로 국내외가 혼란스럽고 재정이 궁핍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이 궁궐을 중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이튿날에는 중건도감을 설치하라는 명을 내렸다. 많은 비용을 들여 경운궁을 중건하는 것보다는 본래 법궁인 경복궁이나 창덕궁으로 이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고종은 단호히 경운궁 중건을 고집하였다. 그리하여 1905년 11월 초에는 중화전이 완공되는 등 거의 중건 사업이 완료되어 갔다.
중건사업이 고종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당시에는 재정 형편이 어렵기도 하였고, 또 고문제도가 실시되면서 1904년 10월부터는 실권은 일본인 재정고문 메가다(目賀田)가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고종의 뜻이 완전히 관철되기는 어려웠다. 그 결과 중건된 건물들 가운데는 옛 모습을 잃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정전인 중화전이다. 원래 중화전은 지붕이 이층으로 되어 있었으나 중건된 중화전은 단층으로 줄어들었다. 개개 건물들만이 아니라 경운궁의 공간구조 자체도 변경되었다.
1905년 일제는 경운궁의 중명전에서 이른바 ‘을사조약(乙巳條約)’을 강제로 체결하였고 1907년에는 헤이그 밀사사건을 빌미로 고종에게 압력을 가하여 강제로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순종을 황제에 앉혔다. 순종은 고종의 영향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일제의 계산에 따라 즉위 이후 얼마되지 않아 창덕궁으로 옮겨가게 되고, 밀려난 황제 고종에게는 ‘덕수(德壽)’라는 궁호가 붙여지게 되었다. 1910년 병합 이후 일제는 궁호를 내세워 고종을 ‘덕수궁 전하’로 격하시켰다.
1919년 고종은 양위(讓位)한 후 13년간을 줄곧 거처하던 침전인 함녕전에서 승하하였다. 고종이 승하하면서 덕수궁도 궁궐로서의 수명을 마치게 된다. 그 후 덕수궁은 그 영역이 크게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전각들이 파괴되고 왜곡되었다. 1922년 일제는 기다렸다는 듯이 선원전의 터를 통과하는 도로를 뚫었다(이 길이 바로 덕수궁 돌담길). 이에 도로 서쪽으로 떨어져 나간 엄비의 혼전은 헐렸고 그로부터 북쪽으로 과거의 경기여고 교사가 신축되었다. 또 도로의 동편에 있던 제사준비소 터에는 지금의 덕수국민학교 교사가 건립되었고, 1927년에는 사단법인 경성방송국이 들어서게 되었다. 1933년경에는 궁내에 있던 대부분의 건물들이 훼철되었으며 이때 잔존한 전각들은 대한문, 광명문, 중화문, 중화전, 즉조당, 석어당, 함녕전 행각 일부, 홍덕전, 구여당, 정관헌 등에 불과하였다. 해방 이후 1960년대에 들어와서도 담장을 허물어낸다거나 돌담대신 철책을 치고, 공원화라는 이름 아래 궁궐의 내부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등 훼손은 계속되었지만, 그리고 창덕궁이나 경복궁의 규모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덕수궁은 파란만장했던 대한제국의 역사현장으로서 커다란 의의를 지니고 있음에 틀림없다.
2. 덕수궁의 주요건물
① 대안문(대한문) : 인화문의 뒤를 이어 경운궁의 정문 노롯을 하게 된 동문의 본 이름은 대안문(大安門)이었으나, 1904년 화재로 중수하면서 대한문(大漢門)이라고 이름을 고쳤다. 이 문 앞에서 군대 사열, 복합상소, 군중 집회 등이 많이 벌어졌다. 1914년 대한문 앞으로 태평로를 내면서 문 오른편의 건물과 담장이 잘려나갔고, 문도 뒤로 옮겨졌다. 그 이후 1970년대에 태평로가 확장되면서 다시 뒤로 옮겨졌다.
② 인화문 터 : 본래 궁궐의 정문 명칭은 경복궁의 광화문(光化門), 창덕궁의 돈화문(敦化門), 창경궁의 홍화문(弘化門), 경희궁의 흥화문(興化門) 등으로 모두 교화를 뜻하는 ‘화(化)’자 돌림이었다. 경운궁의 정문 역시 원래는 인화문(仁化門)이었다. 인화문은 정전인 중화전과 같이 남향이었으나, 1902년 경운궁을 증축하면서 인화문 자리에 건극문(建極門)을 세우고 대신 동향으로 대안문을 세워 정문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 뒤 건극문도 없어지고 담장만이 남게 되었다.
③ 중화전 : 경운궁의 정전(正殿)이다. 원래는 근정전, 인정전 등과 같이 중층(重層) 지붕으로 장엄을 자랑하였으나, 1904년 화재 이후 중건하면서 단층으로 축소되었다.
④ 즉조당, 석어당 :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는 인목대비가 유폐되어 있던 경운궁으로 와서 즉위하였다. 인조가 즉위식을 행한 건물이 즉조당(卽祚堂)이다. 즉조당과 석어당은 광해군 대에 지어진 건물로서 조선후기 내내 옛 건물로서 남아 있었으나, 고종 연간 소실되었다. 현재의 것은 그 직후 중건한 것이다.
⑤ 함령전, 덕홍전 : 함령전은 경운궁의 침전으로서 고종은 대부분 이 건물에서 기거하였고, 이곳에서 승하하였다. 덕홍전은 고종이 외국 사신이나 고위 관료들을 접견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던 건물이다.
⑥ 정관헌 : 함령전 뒤편 동산 위에 있는 건물로서, 연회를 위해 지은 서양식 건물이다.
⑦ ‘석조전’ : 1900년(광무 4) 당시 대한제국의 총세무사였던 영국인 브라운(Sir. John McLeavy Brown)이 주도하여 건축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영국 사람의 설계로 영국인 기술자들이 영국 회사의 물품들을 들여다 짓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05년 브라운을 밀어내고 일본인 메가다(目賀田種太郞)가 재정고문으로 오면서 석조전 건축의 주도권도 그에게로 넘어가서 공사가 진행되어 1909년(융희 3)에 완공되었다. 중명전이 궁궐에 미친 러시아의 입김을 보여준다면 석조전은 영국의 입김, 그리고 나중에는 일본의 입김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하겠다. 그 입김의 범위를 좀더 확대해 보면 당시 우리나라에서 경쟁을 벌이던 이른바 열강의 이권 쟁탈로 이어짐을 들여다 볼 수 있다.
고종 생존시에는 이 건물에서 살기도 하였지만, 그의 사후 경운궁이 황페해지는 과정에서 석조전도 일본 미술품 진열 전시장으로 일반에 공개되었다. 해방 직후 우리나라의 운명을 놓고 미국과 소련이 흥정을 벌일 때는 그 접점인 미소공동위원회가 이곳에서 열리기도 하였다. 그 뒤에는 국제연합 한국위원단이 사용하였다. 1953년 이후 외세의 영향이 단일화한 뒤에는 우리 손으로 넘어와 국립박물관으로, 현대미술관으로 쓰이다가 지금은 궁중유물전시관으로 쓰이고 있다.
⑧ 평성문(포덕문) : 경운궁의 서문. 본 이름은 평성문(平成門)이었으나, 현재는 포덕문(布德門)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⑨ 광명문, 자격루, 흥천사 종 : 광명문은 원래는 함령전으로 들어가는 중문이었다. 지금은 위치가 옮겨져 자격루와 흥천사 종이 그 안에 전시되어 있다.
⑩ 선원전터 : 선원전(璿源殿)이란 태조와 당대 왕의 4대조 전왕의 어진(御眞:초상화)를 모셔놓고 수시로 왕이 다례(茶禮)를 올리던 곳이다. 일제는 그것을 헐어 없애고 여학교를 세웠다. 구 경기여고 자리로서 현재는 미국대사관 이전 예정 부지이다.
⑪ 중명전(重明殿, 수옥헌 漱玉軒) : 1900년에 러시아 건축가가 지은 최초의 서양식 벽돌 건물이다. 1905년 일제가 이곳에서 이른바 ‘을사조약’을 강요하여 불법적으로 체결하였다. 지금은 개인 소유로서 사무실로 쓰이고 있다.
3. 정동 일대
① 외국 공사관과 외국세력의 활동무대 : 1880년대 조선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외국의 공사관이 서울에 설치되었는데, 그 가운데 서양 여러 나라의 공사관은 주로 정동 일대에 설치되었다. 그로부터 용산과 남산 자락 일대가 일본의 영향권, 청계천 일대가 중국의 영향권이었던 데 비해 이곳 정동 일대는 서양 세력의 근거지가 되었다.
미국 공사관은 현재 미국대사관저(하비브 하우스)로, 영국공사관은 현재 영국대사관으로 쓰이고 있다. 러시아 공사관은 대부분 없어지고, 현재 미국대사관저의 서북편, 경향신문사의 동쪽 나즈막한 산자락에 건물의 일부가 탑처럼 남아 있다. 프랑스공사관은 현 창덕여중의 운동장 자리에 있었다.
② 손탁호텔(Sontag Hotel, 孫澤) : 프랑스 혈통의 독일인인 안뜨와네뜨 존타크(Antoinette Sontag)가 경영하던 서울 최초의 서양식 호텔이다. 손탁은 러시아 공사 웨베르의 처형(妻兄)으로서 1885년 8월 28일 대리공사 겸 총영사로 부임하는 웨베르를 따라 서울에 왔다. 명성왕후와 연결되어 궁궐에서 서양인을 접대하며 서양문화를 도입하는 데 교사 역할을 하였다. 이런 인연으로 손탁은 정동 29번지에 있는 184평짜리 집 한 채를 하사받았고, 그 자리에 2층 양옥을 지었다. 손탁 호텔은 서양인 및 이들과 친한 민영환, 이완용, 서재필, 윤치호 등 내국인의 친목단체인 ‘정동구락부’의 근거지로 쓰이기도 하였다. 러일전쟁 이후 손탁 호텔은 위축되었고, 손탁은 1909년 프랑스로 돌아갔다. 손탁 호텔은 1917년 이화학당에 팔렸다. 이화학당에서는 1922년 낡은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3층짜리 프라이 홀(Frey Hall)을 지었다. 프라이 홀은 이화여대, 이화여중, 서울예고 등이 사용하여 오다가 1975년 5월 화재로 없어지고, 그 자리는 현재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③ 종교, 교육기관, 기타 : 정동 일대에는 서양 세력이 들어오면서 정동제일감리교회, 성공회 등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화학당, 배재학당 등 고종의 지원을 받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들어 섰다.
④ 서울 도성 : 인왕산에서 목멱산으로 이어지는 서울 도성에는 숭례문(남대문), 소의문(서소문), 돈의문(서대문) 등 도성문이 있었다. 숭례문은 현재 좌우 성벽이 없어진 채 도로 한복판에 남아 있고, 소의문과 돈의문은 흔적조차 없어졌다. 소의문은 시청에서 아현동으로 이어지는 서소문로의 중앙일보사와 순화빌딩 사이 고개마루에 있었고, 돈의문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서대문 네거리로 이어지는 신문로의 경향신문사에서 기상청으로 건너가는 건널목 자리에 있었다. 현재 도성은 구 배재고와 이화여고 사이에 있는 거대한 회화나무, 이화여고 구내에 있는 성돌들을 통해 그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4. 원구단
원구단(圜丘壇) : 고종은 1897년 2월 20일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한 뒤 8월 14일(음) 연호를 건양(建陽)에서 광무(光武)로 고치고, 천지(天地)와 종묘 사직에 고하기 위하여 원구단(圜丘壇)을 짓기로 하였다. 원구단 터는 원래는 남별궁 자리이다. 9월 17일(음) 원구단에 나아가 천지에 고하는 제사를 드리고 황제에 즉위하였다. 원구단에는 황천상제(皇天上帝)를 비롯하여 황지지(皇地祗), 대명(大明), 야명(夜明), 별과 산천 기타 제 신위를 모셨다. 1899년에는 원구단 뒤편에 황궁우(皇穹宇)를 세워 신위판을 봉안하면서 태조를 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로 추존하여 배천(配天)하였다. 한편 1902년에는 고종 즉위 40년이자 연세가 51세가 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석고(石鼓)를 세웠다. 1913년 일제는 원구단을 헐고 그 자리에 철도호텔을 세웠고, 철도호텔은 그 뒤 조선호텔이 되었다.
덕수궁(德壽宮)은 원래 왕궁이 아니고, 德宗(세조의 왕세자 추존)의 원자(元子) 월산대군(月山大君)의 사저(私邸)로서 서부 황하방(皇華坊 : 현 정동)에 위치하였다. 덕종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 아우인 해양대군(海陽大君)이 세조(世祖)의 제2세자가 되니 이분이 곧 예종(睿宗)이다. 예종이 승하한 후 덕종의 원자인 월산대군에게 왕위를 전하지 아니하고, 덕종의 둘째아들이요 예종의 양자인 성종(成宗)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월산대군은 왕의 친형으로 사저에 거처하였다. 성종 10년 12월에 월산대군이 서거한 후 다만 그 부인인 박씨만 연산군(燕山君) 시기까지 생존하여 있었다.
100여 년 후 임진왜란이 일어나 의주까지 피난했던 선조가 1년 반 만에 서울로 돌아왔으나, 경복(景福), 창덕(昌德), 창경(昌慶) 3궁과 종묘가 병란에 소실된 까닭에 머물 궁이 없었으므로 부득이 옛 월산대군 사택을 임시 행궁(行宮)으로 삼고 이름도 ‘시어소(時御所)’라 하였다. 처음에는 왕실 여러 사람들이 거처하기엔 좁았기 때문에 주변 여러 채의 민가들까지 포괄하여 이를 왕궁으로 개조, 목책(木柵)을 돌려 세웠고 선조 28년에는 길가에다 동문을 세웠다. 선조 40년(1607)에는 별전을 지어 생활공간이 다소 여유로와지기도 했지만, 전각 배치 등이 다소 산만한 느낌을 주었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궁궐과는 거리가 있었다. 선조는 생전에 정궁을 지어 돌아가려 하였으나, 나라의 형편이 여의치 않아 결국 이곳에서 승하하고 만다.
선조의 뒤를 이은 광해군은 1608년 이곳에서 즉위한 후 7년동안 왕궁으로 사용하였다. 1611년(광해군 3)에 창덕궁 복구공사가 마무리되고 그 해 10월에 창덕궁으로 옮겨가면서 행궁을 ‘경운궁(慶運宮)’이라 부르게 하였다. 하지만 광해군은 보름만에 다시 경운궁으로 이어(移御)하였고, 1615년 4월 창덕궁으로 이어하기까지 무려 3년 반이라는 기간을 더 이곳에서 머물렀다. 한편 1623년 반정에 성공한 인조가 경운궁 별당에서 즉위하였으나 곧 대비와 함께 창덕궁으로 이어함으로써 이후 경운궁은 궁궐이라기보다는 옛 행궁터로서, 즉조당(卽祚堂), 석어당(昔御堂)과 왕비의 궁방인 명례궁(明禮宮이라는 경운궁의 또다른 명칭이 여기서 유래) 건물이 몇 채 들어서 있는 정도였다. 그 후로 경운궁은 어려운 시절의 쓰라림을 안은 궁으로 회상되어 왔고, 영조를 비롯한 여러 왕들은 즉조당에서 자기성찰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다.
경운궁이 다시 왕이 임어하는 정식궁궐이 되는 것은 고종때 와서이다. 1895년 을미사변(乙未事變)으로 명성황후 민씨가 시해되고 친일적인 관료들과 일본의 압력이 가중되자 고종은 이듬해 2월 경복궁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俄館播遷).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면서 경복궁이나 창덕궁이 아니라 서양 각국의 공사관들이 밀집해 있는 정동의 경운궁으로 들어갈 생각을 가졌다. 따라서 왕태후와 왕태자비가 머물고 있던 경운궁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게 하는 한편 경복궁에 있던 명성왕후의 빈전과 역시 경복궁 집옥재에 보관되어 있던 선왕들의 초상화(御眞)를 옮겨오게 하였다.
그렇게 준비를 한 끝에 1897년(建陽 2년) 2월 고종과 왕태자는 경운궁으로 환궁하였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돌아온 것을 환궁이라고는 하지만 둘은 경계가 잇닿아 있었으므로 공간적으로는 위치를 조금 옮겨 앉은 데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로써 경운궁은 국왕이 임어하는 유일한 궁궐이 되었다. 경운궁으로 환궁한 뒤 8월 고종은 연호를 건양에서 광무(光武)로 고치고, 오늘날의 조선호텔 자리에 하늘에 제사지내는 원구단(圜丘壇)을 쌓았다. 10월에 가서는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정하고 그 이튿날 원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였다. 고종이 왕으로 경운궁에 임어하던 기간은 1897년부터 1907년 7월 19일, 일본이 헤이그 밀사 사건을 트집잡아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킬 때까지 10년 5개월이 된다.
경운궁이 궁궐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고종의 환궁 이후였다. ‘수리’라기보다는 ‘신축’이라 해야 할 정도의 경운궁 영건 공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많은 건물들이 세워진 것은 물론 1900년(광무 4) 1월 궁장(宮墻) 공사를 마치고, 1902년 2월에는 경복궁의 근정전, 창덕궁의 인정전에 견줄 만한 법전(法殿)인 중화전까지 완공됨으로써 경운궁은 이제 국왕이 임어하는 궁궐로서 필요한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앞서 1880년대 경운궁이 비어 있을 당시 그 터를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의 공사관 터로 잘라 주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운궁 부지는 외국 공사관부지와 섞이게 되었다. 따라서 경복궁처럼 정연한 공간구조를 갖추지는 못하였다. 가장 건물이 많았을 때의 경운궁은 크게 보아 정전인 중화전과 침전인 함령전 등이 있는 주요부와, 주요부 서측의 중명전 등이 있는 구역, 그리고 주요부 서북방의 선원전 등이 있는 구역 등 세 구역으로 나뉜다. 주요부는 대체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덕수궁’ 영역에 해당한다. 이곳에는 정전인 중화전을 비롯하여 침전인 함령전 등 제 이름을 가진 주요 건물들이 약 20여 채가 있었다. 중명전 구역은 오늘날 미국대사관저의 서편에 남아 있는 중명전과 그 주위의 예원학교 일대이다. 오늘날 그 구역에는 중명전만 남아 있고, 그나마 외따로 떨어져 있어 전혀 경운궁의 일부로 생각하기 어렵게 되어 버렸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확인된 바로는 중명전―본래 이름이 수옥헌(漱玉軒)이었던 듯하다― 이외에도 열 채 가량의 건물들이 어울려 하나의 영역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래는 더 많은 건물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뒤편으로 경향신문사 터까지 후원으로 이어졌으리라 짐작된다. 1901년에는 그곳에서 경희궁으로 새문안길을 건너가는 구름다리(虹橋)를 설치하기도 하였으나, 이 구름다리는 1908년 경에 헐렸다. 선원전 구역은 얼마 전까지 경기여고가 있던 터에서부터 영국대사관 북쪽 조선일보사 일대까지이다. 그곳 역시 지금은 덕수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되어 버렸지만 원래는 선왕들의 어진을 모셨던 선원전을 비롯하여 주요건물 다섯 채와 그 부속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서 하나의 영역을 형성하였다.
1904년(광무 8) 4월 경운궁에 큰 불이 났다. 침전인 함령전의 온돌을 수리하다 실화(失火)한 것이 바람을 타고 연속적으로 번지는 바람에 중화전, 즉조당, 석어당, 경효전 등 대부분의 건물과 거기에 비치되거나 소장되었던 집기와 문물들이 한꺼번에 사라지게 된 대화재였다. 고종은 화재가 날 때 함령전 옆의 다른 건물에 있었기에 겨우 화를 면했다. 그 날로 수옥헌으로 처소를 옮긴 고종은 전현직 대신들을 불러 러일전쟁으로 국내외가 혼란스럽고 재정이 궁핍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이 궁궐을 중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이튿날에는 중건도감을 설치하라는 명을 내렸다. 많은 비용을 들여 경운궁을 중건하는 것보다는 본래 법궁인 경복궁이나 창덕궁으로 이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고종은 단호히 경운궁 중건을 고집하였다. 그리하여 1905년 11월 초에는 중화전이 완공되는 등 거의 중건 사업이 완료되어 갔다.
중건사업이 고종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당시에는 재정 형편이 어렵기도 하였고, 또 고문제도가 실시되면서 1904년 10월부터는 실권은 일본인 재정고문 메가다(目賀田)가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고종의 뜻이 완전히 관철되기는 어려웠다. 그 결과 중건된 건물들 가운데는 옛 모습을 잃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정전인 중화전이다. 원래 중화전은 지붕이 이층으로 되어 있었으나 중건된 중화전은 단층으로 줄어들었다. 개개 건물들만이 아니라 경운궁의 공간구조 자체도 변경되었다.
1905년 일제는 경운궁의 중명전에서 이른바 ‘을사조약(乙巳條約)’을 강제로 체결하였고 1907년에는 헤이그 밀사사건을 빌미로 고종에게 압력을 가하여 강제로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순종을 황제에 앉혔다. 순종은 고종의 영향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일제의 계산에 따라 즉위 이후 얼마되지 않아 창덕궁으로 옮겨가게 되고, 밀려난 황제 고종에게는 ‘덕수(德壽)’라는 궁호가 붙여지게 되었다. 1910년 병합 이후 일제는 궁호를 내세워 고종을 ‘덕수궁 전하’로 격하시켰다.
1919년 고종은 양위(讓位)한 후 13년간을 줄곧 거처하던 침전인 함녕전에서 승하하였다. 고종이 승하하면서 덕수궁도 궁궐로서의 수명을 마치게 된다. 그 후 덕수궁은 그 영역이 크게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전각들이 파괴되고 왜곡되었다. 1922년 일제는 기다렸다는 듯이 선원전의 터를 통과하는 도로를 뚫었다(이 길이 바로 덕수궁 돌담길). 이에 도로 서쪽으로 떨어져 나간 엄비의 혼전은 헐렸고 그로부터 북쪽으로 과거의 경기여고 교사가 신축되었다. 또 도로의 동편에 있던 제사준비소 터에는 지금의 덕수국민학교 교사가 건립되었고, 1927년에는 사단법인 경성방송국이 들어서게 되었다. 1933년경에는 궁내에 있던 대부분의 건물들이 훼철되었으며 이때 잔존한 전각들은 대한문, 광명문, 중화문, 중화전, 즉조당, 석어당, 함녕전 행각 일부, 홍덕전, 구여당, 정관헌 등에 불과하였다. 해방 이후 1960년대에 들어와서도 담장을 허물어낸다거나 돌담대신 철책을 치고, 공원화라는 이름 아래 궁궐의 내부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등 훼손은 계속되었지만, 그리고 창덕궁이나 경복궁의 규모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덕수궁은 파란만장했던 대한제국의 역사현장으로서 커다란 의의를 지니고 있음에 틀림없다.
2. 덕수궁의 주요건물
① 대안문(대한문) : 인화문의 뒤를 이어 경운궁의 정문 노롯을 하게 된 동문의 본 이름은 대안문(大安門)이었으나, 1904년 화재로 중수하면서 대한문(大漢門)이라고 이름을 고쳤다. 이 문 앞에서 군대 사열, 복합상소, 군중 집회 등이 많이 벌어졌다. 1914년 대한문 앞으로 태평로를 내면서 문 오른편의 건물과 담장이 잘려나갔고, 문도 뒤로 옮겨졌다. 그 이후 1970년대에 태평로가 확장되면서 다시 뒤로 옮겨졌다.
② 인화문 터 : 본래 궁궐의 정문 명칭은 경복궁의 광화문(光化門), 창덕궁의 돈화문(敦化門), 창경궁의 홍화문(弘化門), 경희궁의 흥화문(興化門) 등으로 모두 교화를 뜻하는 ‘화(化)’자 돌림이었다. 경운궁의 정문 역시 원래는 인화문(仁化門)이었다. 인화문은 정전인 중화전과 같이 남향이었으나, 1902년 경운궁을 증축하면서 인화문 자리에 건극문(建極門)을 세우고 대신 동향으로 대안문을 세워 정문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 뒤 건극문도 없어지고 담장만이 남게 되었다.
③ 중화전 : 경운궁의 정전(正殿)이다. 원래는 근정전, 인정전 등과 같이 중층(重層) 지붕으로 장엄을 자랑하였으나, 1904년 화재 이후 중건하면서 단층으로 축소되었다.
④ 즉조당, 석어당 :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는 인목대비가 유폐되어 있던 경운궁으로 와서 즉위하였다. 인조가 즉위식을 행한 건물이 즉조당(卽祚堂)이다. 즉조당과 석어당은 광해군 대에 지어진 건물로서 조선후기 내내 옛 건물로서 남아 있었으나, 고종 연간 소실되었다. 현재의 것은 그 직후 중건한 것이다.
⑤ 함령전, 덕홍전 : 함령전은 경운궁의 침전으로서 고종은 대부분 이 건물에서 기거하였고, 이곳에서 승하하였다. 덕홍전은 고종이 외국 사신이나 고위 관료들을 접견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던 건물이다.
⑥ 정관헌 : 함령전 뒤편 동산 위에 있는 건물로서, 연회를 위해 지은 서양식 건물이다.
⑦ ‘석조전’ : 1900년(광무 4) 당시 대한제국의 총세무사였던 영국인 브라운(Sir. John McLeavy Brown)이 주도하여 건축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영국 사람의 설계로 영국인 기술자들이 영국 회사의 물품들을 들여다 짓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05년 브라운을 밀어내고 일본인 메가다(目賀田種太郞)가 재정고문으로 오면서 석조전 건축의 주도권도 그에게로 넘어가서 공사가 진행되어 1909년(융희 3)에 완공되었다. 중명전이 궁궐에 미친 러시아의 입김을 보여준다면 석조전은 영국의 입김, 그리고 나중에는 일본의 입김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하겠다. 그 입김의 범위를 좀더 확대해 보면 당시 우리나라에서 경쟁을 벌이던 이른바 열강의 이권 쟁탈로 이어짐을 들여다 볼 수 있다.
고종 생존시에는 이 건물에서 살기도 하였지만, 그의 사후 경운궁이 황페해지는 과정에서 석조전도 일본 미술품 진열 전시장으로 일반에 공개되었다. 해방 직후 우리나라의 운명을 놓고 미국과 소련이 흥정을 벌일 때는 그 접점인 미소공동위원회가 이곳에서 열리기도 하였다. 그 뒤에는 국제연합 한국위원단이 사용하였다. 1953년 이후 외세의 영향이 단일화한 뒤에는 우리 손으로 넘어와 국립박물관으로, 현대미술관으로 쓰이다가 지금은 궁중유물전시관으로 쓰이고 있다.
⑧ 평성문(포덕문) : 경운궁의 서문. 본 이름은 평성문(平成門)이었으나, 현재는 포덕문(布德門)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⑨ 광명문, 자격루, 흥천사 종 : 광명문은 원래는 함령전으로 들어가는 중문이었다. 지금은 위치가 옮겨져 자격루와 흥천사 종이 그 안에 전시되어 있다.
⑩ 선원전터 : 선원전(璿源殿)이란 태조와 당대 왕의 4대조 전왕의 어진(御眞:초상화)를 모셔놓고 수시로 왕이 다례(茶禮)를 올리던 곳이다. 일제는 그것을 헐어 없애고 여학교를 세웠다. 구 경기여고 자리로서 현재는 미국대사관 이전 예정 부지이다.
⑪ 중명전(重明殿, 수옥헌 漱玉軒) : 1900년에 러시아 건축가가 지은 최초의 서양식 벽돌 건물이다. 1905년 일제가 이곳에서 이른바 ‘을사조약’을 강요하여 불법적으로 체결하였다. 지금은 개인 소유로서 사무실로 쓰이고 있다.
3. 정동 일대
① 외국 공사관과 외국세력의 활동무대 : 1880년대 조선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외국의 공사관이 서울에 설치되었는데, 그 가운데 서양 여러 나라의 공사관은 주로 정동 일대에 설치되었다. 그로부터 용산과 남산 자락 일대가 일본의 영향권, 청계천 일대가 중국의 영향권이었던 데 비해 이곳 정동 일대는 서양 세력의 근거지가 되었다.
미국 공사관은 현재 미국대사관저(하비브 하우스)로, 영국공사관은 현재 영국대사관으로 쓰이고 있다. 러시아 공사관은 대부분 없어지고, 현재 미국대사관저의 서북편, 경향신문사의 동쪽 나즈막한 산자락에 건물의 일부가 탑처럼 남아 있다. 프랑스공사관은 현 창덕여중의 운동장 자리에 있었다.
② 손탁호텔(Sontag Hotel, 孫澤) : 프랑스 혈통의 독일인인 안뜨와네뜨 존타크(Antoinette Sontag)가 경영하던 서울 최초의 서양식 호텔이다. 손탁은 러시아 공사 웨베르의 처형(妻兄)으로서 1885년 8월 28일 대리공사 겸 총영사로 부임하는 웨베르를 따라 서울에 왔다. 명성왕후와 연결되어 궁궐에서 서양인을 접대하며 서양문화를 도입하는 데 교사 역할을 하였다. 이런 인연으로 손탁은 정동 29번지에 있는 184평짜리 집 한 채를 하사받았고, 그 자리에 2층 양옥을 지었다. 손탁 호텔은 서양인 및 이들과 친한 민영환, 이완용, 서재필, 윤치호 등 내국인의 친목단체인 ‘정동구락부’의 근거지로 쓰이기도 하였다. 러일전쟁 이후 손탁 호텔은 위축되었고, 손탁은 1909년 프랑스로 돌아갔다. 손탁 호텔은 1917년 이화학당에 팔렸다. 이화학당에서는 1922년 낡은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3층짜리 프라이 홀(Frey Hall)을 지었다. 프라이 홀은 이화여대, 이화여중, 서울예고 등이 사용하여 오다가 1975년 5월 화재로 없어지고, 그 자리는 현재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③ 종교, 교육기관, 기타 : 정동 일대에는 서양 세력이 들어오면서 정동제일감리교회, 성공회 등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화학당, 배재학당 등 고종의 지원을 받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들어 섰다.
④ 서울 도성 : 인왕산에서 목멱산으로 이어지는 서울 도성에는 숭례문(남대문), 소의문(서소문), 돈의문(서대문) 등 도성문이 있었다. 숭례문은 현재 좌우 성벽이 없어진 채 도로 한복판에 남아 있고, 소의문과 돈의문은 흔적조차 없어졌다. 소의문은 시청에서 아현동으로 이어지는 서소문로의 중앙일보사와 순화빌딩 사이 고개마루에 있었고, 돈의문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서대문 네거리로 이어지는 신문로의 경향신문사에서 기상청으로 건너가는 건널목 자리에 있었다. 현재 도성은 구 배재고와 이화여고 사이에 있는 거대한 회화나무, 이화여고 구내에 있는 성돌들을 통해 그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4. 원구단
원구단(圜丘壇) : 고종은 1897년 2월 20일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한 뒤 8월 14일(음) 연호를 건양(建陽)에서 광무(光武)로 고치고, 천지(天地)와 종묘 사직에 고하기 위하여 원구단(圜丘壇)을 짓기로 하였다. 원구단 터는 원래는 남별궁 자리이다. 9월 17일(음) 원구단에 나아가 천지에 고하는 제사를 드리고 황제에 즉위하였다. 원구단에는 황천상제(皇天上帝)를 비롯하여 황지지(皇地祗), 대명(大明), 야명(夜明), 별과 산천 기타 제 신위를 모셨다. 1899년에는 원구단 뒤편에 황궁우(皇穹宇)를 세워 신위판을 봉안하면서 태조를 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로 추존하여 배천(配天)하였다. 한편 1902년에는 고종 즉위 40년이자 연세가 51세가 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석고(石鼓)를 세웠다. 1913년 일제는 원구단을 헐고 그 자리에 철도호텔을 세웠고, 철도호텔은 그 뒤 조선호텔이 되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추억의 실피르넷 게임 커뮤니티 오프닝 멘트 [9] | 실피르넷 | 2010.10.19 | 477396 |
| 6627 | 이런생각이 드는군요... | 데스 | 2004.09.17 | 490 |
| 6626 | 부활... [2] | 이미르 | 2004.08.18 | 490 |
| 6625 | -_- 아자!! 그오오오오옷!!~ [4] | MX-PROTOSS | 2004.06.18 | 490 |
| 6624 | 말아먹을 바이오닉! | 眞아수라 | 2004.06.01 | 490 |
| 6623 | 실피르넷좀 보고-_- [2] | Neozzang | 2004.04.05 | 490 |
| 6622 | 피타텐 을 마스터(?) 했습니다. [5] | Santape99 | 2004.03.22 | 490 |
| 6621 | 쿵짝 쿵짝 쿵짝짝 [9] | 신선 | 2004.03.18 | 490 |
| 6620 | 허허... 워크로 즐기는 스타 와 스타로 즐기는 워크... [4] | Santape99 | 2004.02.23 | 490 |
| » | {펌}덕수궁을 알아보자~ [2] | 실피드의만남 | 2004.02.20 | 490 |
| 6618 | 꺄-----악! [4] | You Suck! | 2004.01.27 | 490 |
| 6617 | 결국 찍었습니다. | 미친엘프 | 2004.01.27 | 490 |
| 6616 | 오에카키...-_-음..제 글 좀 봐주시죠? [5] | 『푸른하늘처럼』 | 2004.01.21 | 490 |
| 6615 | 으아아악!!! | Nightmare | 2004.01.08 | 490 |
| 6614 | ~.~;; [8] | 달빛의그림자 | 2004.01.07 | 490 |
| 6613 | 해보고 왔습니다 [5] | 네모Dori | 2004.01.02 | 490 |
| 6612 | 농심, 라면 가격 6.5% 인상(상보) [7] | 신선 | 2003.12.19 | 490 |
| 6611 | 채널 개편 안내 [4] | 신선 | 2003.12.09 | 490 |
| 6610 | 내일은 시험입니다. [5] | 에어 | 2003.12.08 | 490 |
| 6609 | 흠 대략 대략 대략 =ㅁ=;.. 폐인짓하기위해 ㅎㅎㅎ [3] | 고구마 | 2003.10.29 | 490 |
| 6608 | 휴일의 마지막 밤하늘을 바라보며... | 미친엘프 | 2003.09.15 | 4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