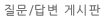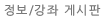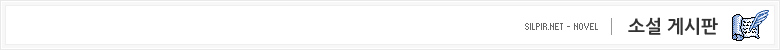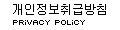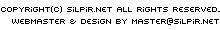최근 댓글
최근 댓글
몽외몽
2006.12.02 07:47
“요즘 꿈을 자주, 아니 항상 꿉니다.”
이는 고개를 들어 그를 힐끗 보고는 다시 진료카드를 살폈다. 이름. 김 신. 나이. 스물둘. 직업. 무직. 증상. 계속되는 꿈에 의한 불면증. 이는 진료카드를 잘 갈무리하고 눈앞의 사내를 다시 바라보았다.
“어떤 꿈을 꾸시나요? 악몽입니까?”
“아니요. 악몽은 아닙니다. 아니, 악몽일 때도 있어요. 항상 다르지만 공통점은 꿈이 모두 생생하기 그지없고 하나도 까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내의 이야기가 끝없이 계속되었다. 빌딩에 오르는 꿈,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꿈, 음식을 한없이 먹는 꿈, 집에 불이 나서 모두 타버리는 꿈, 꿈, 꿈. 이는 눈앞의 사내에게 흥미가 생겼다. 20년 만에 이런 환자는 처음이다. 아니 일생동안 이런 사람은 처음이다. 이렇게 많은 꿈들을 세세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던가? 이는 고장 난 전축마냥 한없이 계속되는 사내의 이야기를 끊으며 말했다.
“잘 알겠습니다. 흥미롭군요. 그럼 가장 최근에 꾼 꿈을 말해주시겠습니까?”
“최근이요? 에……, 그게 3일 전에 꾼 꿈이군요.”
“3일?”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잠을 못 잤거든요. 왜냐하면…….”
“아닙니다. 먼저 3일 전에 꾼 꿈 이야기부터 해 주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꿈에서 저는 처음 보는 별에 있었습니다.”
*
여기는 어디지? 신은 생각한다. 여기는 여기다. 그렇다. 여기는 여기다. 신은 고개를 들어 푸른 해가 지고 녹색 달이 떠오르는 것을 본다. 여기는 여기다. 신의 발 앞에 검은 가지위로 하얀 꽃들이 피어있다. 신은 꽃을 따라 걷는다. 신은 꽃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다. 신은 학교에 도착했다. 온통 검은 학교다. 창문마저도 검다. 아무도 없지만 신은 그것이 학교임을 안다. 오른손에 쥐었던 망치를 치켜든다. 건물보다도 더 큰 망치다. 신은 학교를 부순다.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즐겁다. 검은 벽돌이 산산이 부서져 무너져 내린다. 신은 웃으며 계속 학교를 부순다. 학교가 무너진다. 벽이 무너지며 신을 향해 떨어진다. 그래도 계속 부순다. 검은 벽이 신을 덮친다.
*
“그리고 깨어나는 겁니까?”
“그, 그렇습니다. 어찌나 실제 같은지 정말 천장이 무너져 내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흠, 뭐 어차피 꿈이니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잠을 못 이루십니까?”
눈앞의 사내는 곤혹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 그게 무서워서 말이지요. 어떨 때는 죽는 꿈도 꾸고 활활 타버리는 꿈을 꾸기도 하는데 그럼 그게 너무 실제 같아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요 3일간은 천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눈이 감기지 않아서요.”
이는 웃음을 참으며 신중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정말 흥미로운 케이스다. 그 정도로 실제 같은 꿈을 항상 꾼다는 건가. 아무리 신기하고 재미있어도 이는 의사다. 이는 사내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다.
*
<명석몽 ; 이제는 원하는 꿈을 꾼다.
신은 손에 들린 책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꿈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꾼다니 동화 같은 이야기다. 하지만 정말 꿈을 제어할 수 있다면 앞으로 잠을 설칠 일도 없겠지. 신은 굳은 표정으로 책을 펼쳤다.
*
“들어오세요.”
이는 건조한 목소리로 다음 환자를 부르며 진료카드를 살폈다. 이름. 김 신. 나이. 스물둘. 직업. 자영업. 어라? 이는 고개를 들어 들어오는 새로운 환자를 바라보았다. 생생한 꿈을 꾼다던 그 사내다.
“지난번의 그 분이시군요. 이젠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의 질문에 사내는 큼직한 미소를 지었다. 몇 개월 전과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이었다. 퀭하던 눈은 빛나고 있었고 피부에는 윤기가 흘렀다. 사내는 이의 앞에 앉으며 말했다.
“매우 좋아졌습니다. 다 선생님 덕입니다.”
“명석몽 훈련이 도움이 되던가요?”
“되다마다요. 이젠 완벽하게 제어합니다. 꿈속에서 저 뿐 아니라 모든 상황을 움직일 수 있지요. 아, 그리고 이것 받으십시오.”
사내는 이에게 명함을 한 장 내밀었다. 검은 종이에 글자는 은색으로 명함 한 귀퉁이에 타이프 되어 있다. 작아서 쉽게 읽기 힘든 글자를 이는 눈 가까이 끌어당겼다. <夢外夢(몽외몽). 金 神(김 신)> 다섯 한자가 은색으로 빛날 뿐 온통 검다.
“몽외몽? 무엇인가요?”
“제 새로운 사업입니다. 음, 간단하게 말하면 길몽을 파는 사업이지요.”
사내는 몇 개월 전보다 훨씬 더 흥미로워져 있었다. 처음에는 무섭지 않은 꿈을 꾸도록 꿈을 통제하기만 했다. 하지만 차차 요령이 붙으면서 이왕이면 길몽이라고 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처음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생각에 해몽서들을 읽으며 좋은 상황을 꾸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꿈에 대한 지식은 점점 더 많아졌고 꿈도 구체화되었다. 그러다 그는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다. 이 꿈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어떨까?
“호오, 그게 인기가 있었나요?”
“저도 처음에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었죠. 아아, 물론 처음부터 돈을 받은 건 아닙니다. 고시를 준비하는 녀석이 하도 걱정이 많기에 꿈이나 하나 사라고 권한 게 시작이었죠.”
*
먼저 어떤 꿈을 꿀까 고민했다. 시험과 관련된 길몽은 많다. 하지만 이왕이면 좋은 것이 두어 개 겹친 것이 좋겠지. 신은 연습장을 펴고 몇 가지 내용을 적었다. 내용을 확실히 숙지한 다음, 신은 꿈에 빠져들었다.
*
감았던 눈을 뜬다. 푸른 하늘이 환하다. 잔디가 하늘만큼이나 푸르다. 파란 나비가 날아온다. 주위를 맴돈다. 즐겁다. 나비를 향해 손을 내민다. 잠깐 손가락 사이를 맴돌던 나비는 푸른 하늘을 향해 날아오른다. 푸른 하늘에 푸른 나비. 즐겁다. 웃는다. 나비를 따라 위로 올라간다. 푸른 산이 한없이 높다. 하지만 힘들지 않다. 즐겁다. 웃는다. 산의 꼭대기에 오른다. 커다란 바위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크다. 바위 위로 올라간다. 바위 한 가운데 꽃이 피어있다. 하얀 꽃잎 위에 푸른 나비가 앉아있다. 손을 내밀어 꽃을 꺾는다. 나비는 다시 하늘로 날아오른다.
*
신은 일어나는 대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직 잠을 완벽하게 깨지 못해서 불명확한 발음이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정확히 꿈을 들려준다. 그리고 묻는다.
“이 꿈을 살 테냐?”
“어, 좋은 꿈이야?”
“고시 합격엔 이만한 꿈도 없을 거다. 좋아.”
“얼마에 사면되지?”
신은 말문이 막혔다. 얼마에 팔아야 하지? 꿈을 팔려면 공짜로 주어서는 안 된다. 대가를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대가를 받아야하지? 무엇보다도 이런 게 효과가 있을까. 고민하다 얼마 전 친구가 자랑하던 술이 떠오른다.
“너 저번에 일본에서 가져온 정종 있지? 그걸로 하자.”
“아, 그런 걸로 되나? 좋아. 오늘 당장 가져다줄게. 내가 붙기만 하면 정종을 박스로 사다주마.”
“됐어, 공부나 열심히 해라. 난 좀 더 자련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계속 말하는 친구의 전화를 끊으며 신은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다.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래도 대단한 것을 해 준 기분이었다.
*
“그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하하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모르죠. 다만 확실한 건 그 친구가 고시를 패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지요. 사람들의 부탁이 점점 늘어갔고 나중에는 대가가 점점 커지더군요.”
“호오. 그게 직업으로 삼을 정도로 벌이가 좋습니까?”
사내는 큼지막하게 미소 지으며 손바닥을 쫙 폈다.
“오백?”
-절레절레-
“오천?”
-절레절레-
“오억?!”
-끄덕끄덕-
“석 달에 오억을 벌었다는 말입니까?! 꿈을 팔아서요?”
-절레절레-
“에?”
사내의 미소는 귀에 걸린 듯 했다.
“이번 주 동안 오억을 벌었다는 이야깁니다.”
이는 멍한 눈으로 사내를 바라보았다.
*
“그래서 선생님께도 꿈을 하나 팔까 하구요.”
이는 사내의 제의에 황당하면서도 솔깃함을 느끼는 것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었다.
“꿈이라, 어떤 꿈을 파시려구요?”
“어떤 꿈이든, 원하시는 꿈을 드리지요. 사실 따져보면 선생님 덕택에 명석몽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호오, 그러면 도……,아니 제 자식들 잘 되는 꿈을 부탁할까요?”
“뭐, 그러죠. 그럼 제 전화를 기다려주십시오.”
사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진료실을 떠났다. 이는 그가 사라진 자리를 아무 말 없이 응시했다. 정말 흥미로운 사내다.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
그 사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오지는 않았다. 이가 그 사내의 이름을 다시 접한 것은 한 스포츠신문의 귀퉁이에서였다. <꿈을 파는 사기꾼, 김 모 씨 검거> 짤막한 기사. 하지만 더 이상은 필요 없는 기사였다. 그는 나에게 어떤 꿈을 팔려고 했을까, 얼마나 좋은 길몽이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요구했을까. 이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오세요.”
-------------------------------------------------------------------
원 아이디어는 어디선가 가져왔음을 밝힙니다.
이는 고개를 들어 그를 힐끗 보고는 다시 진료카드를 살폈다. 이름. 김 신. 나이. 스물둘. 직업. 무직. 증상. 계속되는 꿈에 의한 불면증. 이는 진료카드를 잘 갈무리하고 눈앞의 사내를 다시 바라보았다.
“어떤 꿈을 꾸시나요? 악몽입니까?”
“아니요. 악몽은 아닙니다. 아니, 악몽일 때도 있어요. 항상 다르지만 공통점은 꿈이 모두 생생하기 그지없고 하나도 까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내의 이야기가 끝없이 계속되었다. 빌딩에 오르는 꿈,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꿈, 음식을 한없이 먹는 꿈, 집에 불이 나서 모두 타버리는 꿈, 꿈, 꿈. 이는 눈앞의 사내에게 흥미가 생겼다. 20년 만에 이런 환자는 처음이다. 아니 일생동안 이런 사람은 처음이다. 이렇게 많은 꿈들을 세세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던가? 이는 고장 난 전축마냥 한없이 계속되는 사내의 이야기를 끊으며 말했다.
“잘 알겠습니다. 흥미롭군요. 그럼 가장 최근에 꾼 꿈을 말해주시겠습니까?”
“최근이요? 에……, 그게 3일 전에 꾼 꿈이군요.”
“3일?”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잠을 못 잤거든요. 왜냐하면…….”
“아닙니다. 먼저 3일 전에 꾼 꿈 이야기부터 해 주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꿈에서 저는 처음 보는 별에 있었습니다.”
*
여기는 어디지? 신은 생각한다. 여기는 여기다. 그렇다. 여기는 여기다. 신은 고개를 들어 푸른 해가 지고 녹색 달이 떠오르는 것을 본다. 여기는 여기다. 신의 발 앞에 검은 가지위로 하얀 꽃들이 피어있다. 신은 꽃을 따라 걷는다. 신은 꽃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다. 신은 학교에 도착했다. 온통 검은 학교다. 창문마저도 검다. 아무도 없지만 신은 그것이 학교임을 안다. 오른손에 쥐었던 망치를 치켜든다. 건물보다도 더 큰 망치다. 신은 학교를 부순다.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즐겁다. 검은 벽돌이 산산이 부서져 무너져 내린다. 신은 웃으며 계속 학교를 부순다. 학교가 무너진다. 벽이 무너지며 신을 향해 떨어진다. 그래도 계속 부순다. 검은 벽이 신을 덮친다.
*
“그리고 깨어나는 겁니까?”
“그, 그렇습니다. 어찌나 실제 같은지 정말 천장이 무너져 내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흠, 뭐 어차피 꿈이니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잠을 못 이루십니까?”
눈앞의 사내는 곤혹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 그게 무서워서 말이지요. 어떨 때는 죽는 꿈도 꾸고 활활 타버리는 꿈을 꾸기도 하는데 그럼 그게 너무 실제 같아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요 3일간은 천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눈이 감기지 않아서요.”
이는 웃음을 참으며 신중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정말 흥미로운 케이스다. 그 정도로 실제 같은 꿈을 항상 꾼다는 건가. 아무리 신기하고 재미있어도 이는 의사다. 이는 사내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다.
*
<명석몽 ; 이제는 원하는 꿈을 꾼다.
신은 손에 들린 책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꿈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꾼다니 동화 같은 이야기다. 하지만 정말 꿈을 제어할 수 있다면 앞으로 잠을 설칠 일도 없겠지. 신은 굳은 표정으로 책을 펼쳤다.
*
“들어오세요.”
이는 건조한 목소리로 다음 환자를 부르며 진료카드를 살폈다. 이름. 김 신. 나이. 스물둘. 직업. 자영업. 어라? 이는 고개를 들어 들어오는 새로운 환자를 바라보았다. 생생한 꿈을 꾼다던 그 사내다.
“지난번의 그 분이시군요. 이젠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의 질문에 사내는 큼직한 미소를 지었다. 몇 개월 전과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이었다. 퀭하던 눈은 빛나고 있었고 피부에는 윤기가 흘렀다. 사내는 이의 앞에 앉으며 말했다.
“매우 좋아졌습니다. 다 선생님 덕입니다.”
“명석몽 훈련이 도움이 되던가요?”
“되다마다요. 이젠 완벽하게 제어합니다. 꿈속에서 저 뿐 아니라 모든 상황을 움직일 수 있지요. 아, 그리고 이것 받으십시오.”
사내는 이에게 명함을 한 장 내밀었다. 검은 종이에 글자는 은색으로 명함 한 귀퉁이에 타이프 되어 있다. 작아서 쉽게 읽기 힘든 글자를 이는 눈 가까이 끌어당겼다. <夢外夢(몽외몽). 金 神(김 신)> 다섯 한자가 은색으로 빛날 뿐 온통 검다.
“몽외몽? 무엇인가요?”
“제 새로운 사업입니다. 음, 간단하게 말하면 길몽을 파는 사업이지요.”
사내는 몇 개월 전보다 훨씬 더 흥미로워져 있었다. 처음에는 무섭지 않은 꿈을 꾸도록 꿈을 통제하기만 했다. 하지만 차차 요령이 붙으면서 이왕이면 길몽이라고 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처음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생각에 해몽서들을 읽으며 좋은 상황을 꾸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꿈에 대한 지식은 점점 더 많아졌고 꿈도 구체화되었다. 그러다 그는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다. 이 꿈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어떨까?
“호오, 그게 인기가 있었나요?”
“저도 처음에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었죠. 아아, 물론 처음부터 돈을 받은 건 아닙니다. 고시를 준비하는 녀석이 하도 걱정이 많기에 꿈이나 하나 사라고 권한 게 시작이었죠.”
*
먼저 어떤 꿈을 꿀까 고민했다. 시험과 관련된 길몽은 많다. 하지만 이왕이면 좋은 것이 두어 개 겹친 것이 좋겠지. 신은 연습장을 펴고 몇 가지 내용을 적었다. 내용을 확실히 숙지한 다음, 신은 꿈에 빠져들었다.
*
감았던 눈을 뜬다. 푸른 하늘이 환하다. 잔디가 하늘만큼이나 푸르다. 파란 나비가 날아온다. 주위를 맴돈다. 즐겁다. 나비를 향해 손을 내민다. 잠깐 손가락 사이를 맴돌던 나비는 푸른 하늘을 향해 날아오른다. 푸른 하늘에 푸른 나비. 즐겁다. 웃는다. 나비를 따라 위로 올라간다. 푸른 산이 한없이 높다. 하지만 힘들지 않다. 즐겁다. 웃는다. 산의 꼭대기에 오른다. 커다란 바위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크다. 바위 위로 올라간다. 바위 한 가운데 꽃이 피어있다. 하얀 꽃잎 위에 푸른 나비가 앉아있다. 손을 내밀어 꽃을 꺾는다. 나비는 다시 하늘로 날아오른다.
*
신은 일어나는 대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직 잠을 완벽하게 깨지 못해서 불명확한 발음이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정확히 꿈을 들려준다. 그리고 묻는다.
“이 꿈을 살 테냐?”
“어, 좋은 꿈이야?”
“고시 합격엔 이만한 꿈도 없을 거다. 좋아.”
“얼마에 사면되지?”
신은 말문이 막혔다. 얼마에 팔아야 하지? 꿈을 팔려면 공짜로 주어서는 안 된다. 대가를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대가를 받아야하지? 무엇보다도 이런 게 효과가 있을까. 고민하다 얼마 전 친구가 자랑하던 술이 떠오른다.
“너 저번에 일본에서 가져온 정종 있지? 그걸로 하자.”
“아, 그런 걸로 되나? 좋아. 오늘 당장 가져다줄게. 내가 붙기만 하면 정종을 박스로 사다주마.”
“됐어, 공부나 열심히 해라. 난 좀 더 자련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계속 말하는 친구의 전화를 끊으며 신은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다.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래도 대단한 것을 해 준 기분이었다.
*
“그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하하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모르죠. 다만 확실한 건 그 친구가 고시를 패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지요. 사람들의 부탁이 점점 늘어갔고 나중에는 대가가 점점 커지더군요.”
“호오. 그게 직업으로 삼을 정도로 벌이가 좋습니까?”
사내는 큼지막하게 미소 지으며 손바닥을 쫙 폈다.
“오백?”
-절레절레-
“오천?”
-절레절레-
“오억?!”
-끄덕끄덕-
“석 달에 오억을 벌었다는 말입니까?! 꿈을 팔아서요?”
-절레절레-
“에?”
사내의 미소는 귀에 걸린 듯 했다.
“이번 주 동안 오억을 벌었다는 이야깁니다.”
이는 멍한 눈으로 사내를 바라보았다.
*
“그래서 선생님께도 꿈을 하나 팔까 하구요.”
이는 사내의 제의에 황당하면서도 솔깃함을 느끼는 것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었다.
“꿈이라, 어떤 꿈을 파시려구요?”
“어떤 꿈이든, 원하시는 꿈을 드리지요. 사실 따져보면 선생님 덕택에 명석몽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호오, 그러면 도……,아니 제 자식들 잘 되는 꿈을 부탁할까요?”
“뭐, 그러죠. 그럼 제 전화를 기다려주십시오.”
사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진료실을 떠났다. 이는 그가 사라진 자리를 아무 말 없이 응시했다. 정말 흥미로운 사내다.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
그 사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오지는 않았다. 이가 그 사내의 이름을 다시 접한 것은 한 스포츠신문의 귀퉁이에서였다. <꿈을 파는 사기꾼, 김 모 씨 검거> 짤막한 기사. 하지만 더 이상은 필요 없는 기사였다. 그는 나에게 어떤 꿈을 팔려고 했을까, 얼마나 좋은 길몽이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요구했을까. 이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오세요.”
-------------------------------------------------------------------
원 아이디어는 어디선가 가져왔음을 밝힙니다.
댓글 1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371 |
[상상연작] 퇴락
[1] | 반 | 2006.12.26 | 1843 |
| 370 |
[상상연작] 정류장
| 네모Dori | 2006.12.25 | 1743 |
| 369 |
[상상연작관련공지] 세번째이미지입니다!
[1] | 네모Dori | 2006.12.11 | 2326 |
| 368 | 눈이 오지 않는 마을. | 네모Dori | 2006.12.08 | 1802 |
| 367 |
[상상연작] 그대에게 건배
[1] | 네모Dori | 2006.12.05 | 1856 |
| 366 |
[상상연작]
[1] | 창暢 | 2006.12.05 | 1538 |
| » | 몽외몽 [1] | 네모Dori | 2006.12.02 | 1826 |
| 364 | [상상연작] [3] | 크래닉스 | 2006.12.01 | 1653 |
| 363 | [상상연작] 내 안의 모든 것을 그대에게. [4] | 오우거 | 2006.11.30 | 1701 |
| 362 |
[상상연작관련공지] 새로운 이미지 입니다!
[2] | 네모Dori | 2006.11.30 | 2042 |
| 361 | [상상연작]칼의 마음 [3] | 창暢 | 2006.11.28 | 1519 |
| 360 | [상상연작] 그의 본심 [3] | 넋 | 2006.11.27 | 1674 |
| 359 | [상상연작] 칼의 노래 [2] | 네모Dori | 2006.11.27 | 1612 |
| 358 | 제2차 릴레이 소설 1회. [8] | 창暢 | 2006.11.09 | 1864 |
| 357 | 지랄맞은세계 [1] | kei | 2006.11.08 | 1582 |
| 356 | 달님의 집에 놀러가요. | 네모Dori | 2006.11.08 | 1579 |
| 355 | 넌 그냥 게으른거야. | 네모Dori | 2006.11.05 | 1661 |
| 354 | 마고 | 네모Dori | 2006.10.24 | 1585 |
| 353 | 낙타 | 네모Dori | 2006.10.24 | 1696 |
| 352 | 한마디의 말도, | 네모Dori | 2006.10.24 | 1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