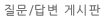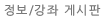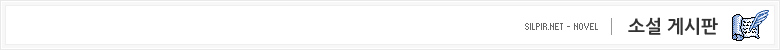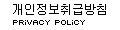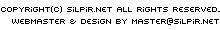최근 댓글
최근 댓글
비의 술사[신들의 이야기]
2005.04.21 17:46
비의 술사 신들의 이야기
4계절 신. 그중 겨울.
나비 그리고 겨울.
-시아
-그대가 겨울을 부르는 자군요.
맑고 청초한 목소리. 기나긴 겨울잠에서 일어나 듣는 봄의 목소리.
-자네는 우리와 다른 자로군. 흰색의 파멸을 부르는 자여.
낮고 울리는 중년 사내의 목소리. 봄의 생명의 꽃을 이어받는 여름의 목소리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즐거울 것 같군요.
높고 가는 미성. 여름의 꽃을 잠재우는 싸늘한 가을의 목소리.
그리고
-난····
중저음 바리톤. 어딘가 슬프기도 우울하기도 한 목소리. 모든 생명을 잠재우는 싸늘한 겨울의 목소리. 그것은 곧 나의 목소리.
#
저 멀리 파란 하늘 사이로 나비가 날고 있다. 그 작은 날개를 팔랑이며 어디로 가는 것인지 모르지만 내 눈은 계속 나비를 쫓고 있다. 날갯짓을 한번 두 번 할 때마다 상큼한 과일향이 난다. 말로만 듣던 과일 나비[FRUIT BUTTERFLY]를 본건 처음이었으므로 나에겐 더 없이 좋은 눈 요깃거리였다.
“아아 스히렌. 또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군요. 여기서 하릴 없이 빈둥거릴 거면 차라리 책이라도 읽어요. 당신이 빈둥거리는 꼴을 보면 나만 일하는 거 같아 억울하잖아요.”
나의 연인 나의 사랑. 하지만 언젠가는 헤어져야할 그녀가 뒤에서 나에게 살짝 안기며 한숨과 함께 투덜거린다. 살랑대는 바람에 그녀의 적갈색 머리카락이 내 볼을 간질인다.
“······”
“이봐요 스히렌! 내말이 들리긴 들리는 거예요? 너무 오래 앉아 있어 망부석이라도 된 건가요?”
그녀가 고개를 내 어깨에 걸치며 한층 더 귀엽게 투덜거렸다.
“쉿!”
나는 다급히 내 손가락을 그녀의 입술에 가져다 댔다. 부드러운 그녀의 입술을 느낄 겨를도 없이 나는 자유로운 한 손을 들어 올려 허공에 얼음을 흩뿌렸다.
-솨아아
얇은 얼음을 넣고 씹었을 때나 날법한 사각거리는 소리가 허공에서 들렸다.
얇은 얼음은 태양빛을 빨아들이며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무지개로 변하였고 그것들은 곧 나의 손짓에 따라 이리 저리 떠 다녔다. 어두울 때 봤으면 수십 마리의 요정 같았으리라.
그것은 곧 우리 두 사람의 위로 오더니 눈꽃처럼 내리기 시작했다. 반짝반짝 거리며 우리 주위를 맴돌며 빛나는 눈꽃들은 너무도 아름다웠다.
“화아...”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는 주위를 맴도는 얼음 조각들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곧 그것은 녹아 내렸고 그녀는 아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또 해달라는 건가?”
무시무시한 속도로 고개를 끄덕거리는 그녀. 그녀는 배시시 웃어 보이며 내 팔에 매달렸다.
“싫어”
“엑 어째서! 치사해요. 스히렌 나빠! 바보 멍텅구리!”
“귀찮단 말이야”
큰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있고 두 손은 어느새 내 두 뺨을 잡고 흔들어 대었다.
“이이익! 당신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녀가 흔드는 강도를 더 높이자 나는 손을 들어 그녀의 앞에 가져갔다. 잠깐 이지만 그녀가 흔드는 것을 멈췄다. 나의 손이 무엇을 하려나 궁금할 테지. 나는 살짝 미소 지어 보이고는 그녀의 볼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끼아아아악!”
똑같이 볼을 잡고 흔들어 대기 시작했다.
“스히헨! 그하해요! 미힌 하함 허럼 보혀요”
그녀의 말을 해석 하는 데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 했지만 그리 오래 걸린 것도 아니었다. 확실히 우리 옆을 지나는 사람들은 저마다 웃음을 참으며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하긴 그도 그럴 것이 벌건 대낮에 분위기 좋은 동산에서 서로의 볼을 있는 힘껏 잡고 흔들어 대는 광경은 그다지 아름다운 광경은 아니리라.
“먼허 푸허”
“이익!”
그녀는 결국 나를 잡은 손을 놓았다. 그러고는 토라져 버린 건지 고개를 팩 돌려버렸다. 그리고 우리는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다. 내가 잘못 본게 아니라면 그녀의 어깨는 약간씩 들썩이고 있었다.
“아...저기 세디나?”
“········”
“으음...미안해, 울지 마...화 많이··”
“시끄러워요!”
“····”
그녀가 이렇게 화내는 건 처음이다.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웃음을 잃지 않던 그녀인데 지금은 눈물마저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눈물을 보던 나는 움찔하여 아무 말도 못했다.
“만날 자기 하고 싶은 대로야! 당신이 제일 중요해요? 당신이 최고예요? 그럼 왜 날 만난 거예요? 왜 날 사랑한다고 말한 거예요? 당신이 제일 중요하면서! 왜 날 이렇게 만드는데요!”
“그··그건”
“됐어요. 이젠 싫어요. 당신에게 이리 저리 휘둘리는 건 질렸어요! 짜증 난다구요.”
그대로 그녀는 벌떡 일어나 달려갔다. 순간 멍 해져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난 망연자실 앉아만 있었다. 때는 해가 지는 저녁 이었고 싸늘한 바람이 나를 감쌌다. 잔뜩 쪼그려 무릎에 머리를 묻고 있던 나는 손을 펴 얼음을 만들었다. 그리고 얼음들이 굳어 가며 만들어 진건 반짝이고 투명한 반지. 오늘은 반드시 말하려고 했는데. 일이 꼬였다.
“젠장···”
-파삭
얼음 반지가 내 손에서 깨지며 흩날렸다. 그리고 내 눈에서 흐른 눈물도 함께 흩날렸다.
#
“자아! 오늘은 세디나 그레이 양과 뮤티스 클라이 군의 영원을 맹세하는 날 입니다.”
-와아아아아
하얀 면사포를 쓰고 있어 무슨 얼굴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세디나. 그리고 그녀의 옆에 서서 연신 히죽거리는 뮤티스.
그녀가 못보게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그녀를 쳐다 보고 있다. 그녀를 좀더 가까이서 보길 원해 얼음으로 렌즈를 만들어 그녀를 더운 크게 봤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답다. 나에게만 보여주던 미소를. 나만을 만져주던 그 손을. 빼앗겼다.
저런 보잘 것 없는 멍청한 수컷에게 빼앗겼다.
“자..그럼 두분은 맹세의 키스를..”
수줍은 듯 고개를 떨어뜨리는 그녀. 흥분으로 떨리는 손을 겨우 진정 시키며 그녀의 볼을 잡은 후 입술을 포개는 뮤티스.
언젠가는 헤어져야할 사랑이었지만 이런 식의 이별을 바란 건 아니었다. 언젠가는 후회 할걸 알고 있었지만 이런 후회는 싫었다.
눈물 때문에 앞이 보이질 않는다. 그리고 그대로 나는 정신을 잃는다.
그리고 날개가 없는 난 떨어진다. 한 마리 나비 이고 싶었던 나는 떨어진다.
‘그녀‘라는 꽃을 슬프게 한 나는 죄인이다.
#
내가 일어나 처음 본 곳은 지옥이었다. 차갑게 얼어버린 여러 사람들의 피. 여기저기 삐죽삐죽 솟아나 사람들을 꽤 뚫고 있는 얼음 기둥들. 그 중에 제일 참혹한 뮤티스의 시신. 머리는 얼음 덩어리로 으깨지고 팔 다리는 날카로운 무언가에 의해 잘려져 나갔다. 배는 뭐에 찔렸는지 구멍이 열개도 넘어 보였고 곳곳에서는 창자가 삐져나와 있었다.
“우..우읍!”
처음 보는 낯선 광경에 나는 그대로 안에 있던 것을 게워냈다.
한참을 그러다 문득 시선이 나의 왼쪽으로 갔다 그곳엔···그녀가 있었다. 얼어버린 채로. 커다란 얼음 감옥에 갇혀 얼어버린 그녀가 있었다.
“아....아흑..”
웃고 있다. 그녀는 차디찬 얼음 속에 갇혀 웃고 있다. 얼음을 붙잡고 녹이려 했다. 두껍지만 녹이려 했다. 녹지 않는다. 얼음은 마치 만년설처럼 얼어붙어 그녀를 내보내지 않는다. 늦은 후회란 걸까. 아픔이란 이런 것일까. 말이 나오지 않는다. 입이 얼어붙었는지 말이 나오질 못한다. 목에 뭐가 걸린 듯 자꾸 꺽꺽거리기만 하고 전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눈에서 무엇이 그리 슬픈지 연신 눈물이 흐른다. 땅에 떨어질 때마다 촉촉이 젖어 드는 얼음. 하지만 역시 녹진 않는다.
“미안...많이 아팠지”
만질 순 없지만. 다가 갈순 없지만 그녀의 볼에 내 차가운 손을 대었다. 따듯함은 느껴지지 않는다. 이별 하리란건 알고 있었지만 싫다. 이제 그녀를 평생 간직하고 싶다. 평생 같이 웃고 싶다.
“다신 안 그럴게..꼬집어도 같이 안 꼬집을 테니까..”
손이 주르르 미끄러져 내린다. 미끄러지지 않으려 일부러 손톱을 세워 긁는다. 손톱이 빠질 때까지 그렇게 긁어 대었다.
“돌아와...돌아와...제발..돌아와...”
연신 얼음을 긁어대며 울부짖었다. 손가락이 아팠지만 그녀의 마음만큼은 아니리라.
눈물이 말랐지만 그녀는 이미 나 때문에 눈물이 말라 미소밖에 남은 게 없었으리라. 나에게 보여준 미소는 눈물 대신이었던 것이리라.
“돌아오란 말이야 이 바보야!”
얼음은 어느새 붉게 물들었고 그 안으로 보이는 그녀의 새하얀 드레스는 붉게 물든 듯 했다. 멍 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문득 얼음이 녹아 그녀의 눈 부분에서부터 흘러 내렸다.
손톱이 빠져 흉해지고 아픈 손 이었지만 손을 살며시 들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 주었다.
그녀가 더 이상 울지 않을 때까지 난 옆에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나. 여기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기다릴 것이다. 그녀가 일어나 나에게 아침 인사를 건넬 때까지.
지독한 악몽이 있던 밤 다음날에 맞이하는 상쾌한 아침이 고마운걸 알기에.
여기서 그녈 바라보며 살 것이다.
이게 나 겨울의 신이자 그녀의 노예 되기를 자청한 스히렌 즈 우인테르. 나와 그녀사이의 약속이다.
4계절 신. 그중 겨울.
나비 그리고 겨울.
-시아
-그대가 겨울을 부르는 자군요.
맑고 청초한 목소리. 기나긴 겨울잠에서 일어나 듣는 봄의 목소리.
-자네는 우리와 다른 자로군. 흰색의 파멸을 부르는 자여.
낮고 울리는 중년 사내의 목소리. 봄의 생명의 꽃을 이어받는 여름의 목소리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즐거울 것 같군요.
높고 가는 미성. 여름의 꽃을 잠재우는 싸늘한 가을의 목소리.
그리고
-난····
중저음 바리톤. 어딘가 슬프기도 우울하기도 한 목소리. 모든 생명을 잠재우는 싸늘한 겨울의 목소리. 그것은 곧 나의 목소리.
#
저 멀리 파란 하늘 사이로 나비가 날고 있다. 그 작은 날개를 팔랑이며 어디로 가는 것인지 모르지만 내 눈은 계속 나비를 쫓고 있다. 날갯짓을 한번 두 번 할 때마다 상큼한 과일향이 난다. 말로만 듣던 과일 나비[FRUIT BUTTERFLY]를 본건 처음이었으므로 나에겐 더 없이 좋은 눈 요깃거리였다.
“아아 스히렌. 또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군요. 여기서 하릴 없이 빈둥거릴 거면 차라리 책이라도 읽어요. 당신이 빈둥거리는 꼴을 보면 나만 일하는 거 같아 억울하잖아요.”
나의 연인 나의 사랑. 하지만 언젠가는 헤어져야할 그녀가 뒤에서 나에게 살짝 안기며 한숨과 함께 투덜거린다. 살랑대는 바람에 그녀의 적갈색 머리카락이 내 볼을 간질인다.
“······”
“이봐요 스히렌! 내말이 들리긴 들리는 거예요? 너무 오래 앉아 있어 망부석이라도 된 건가요?”
그녀가 고개를 내 어깨에 걸치며 한층 더 귀엽게 투덜거렸다.
“쉿!”
나는 다급히 내 손가락을 그녀의 입술에 가져다 댔다. 부드러운 그녀의 입술을 느낄 겨를도 없이 나는 자유로운 한 손을 들어 올려 허공에 얼음을 흩뿌렸다.
-솨아아
얇은 얼음을 넣고 씹었을 때나 날법한 사각거리는 소리가 허공에서 들렸다.
얇은 얼음은 태양빛을 빨아들이며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무지개로 변하였고 그것들은 곧 나의 손짓에 따라 이리 저리 떠 다녔다. 어두울 때 봤으면 수십 마리의 요정 같았으리라.
그것은 곧 우리 두 사람의 위로 오더니 눈꽃처럼 내리기 시작했다. 반짝반짝 거리며 우리 주위를 맴돌며 빛나는 눈꽃들은 너무도 아름다웠다.
“화아...”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는 주위를 맴도는 얼음 조각들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곧 그것은 녹아 내렸고 그녀는 아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또 해달라는 건가?”
무시무시한 속도로 고개를 끄덕거리는 그녀. 그녀는 배시시 웃어 보이며 내 팔에 매달렸다.
“싫어”
“엑 어째서! 치사해요. 스히렌 나빠! 바보 멍텅구리!”
“귀찮단 말이야”
큰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있고 두 손은 어느새 내 두 뺨을 잡고 흔들어 대었다.
“이이익! 당신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녀가 흔드는 강도를 더 높이자 나는 손을 들어 그녀의 앞에 가져갔다. 잠깐 이지만 그녀가 흔드는 것을 멈췄다. 나의 손이 무엇을 하려나 궁금할 테지. 나는 살짝 미소 지어 보이고는 그녀의 볼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끼아아아악!”
똑같이 볼을 잡고 흔들어 대기 시작했다.
“스히헨! 그하해요! 미힌 하함 허럼 보혀요”
그녀의 말을 해석 하는 데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 했지만 그리 오래 걸린 것도 아니었다. 확실히 우리 옆을 지나는 사람들은 저마다 웃음을 참으며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하긴 그도 그럴 것이 벌건 대낮에 분위기 좋은 동산에서 서로의 볼을 있는 힘껏 잡고 흔들어 대는 광경은 그다지 아름다운 광경은 아니리라.
“먼허 푸허”
“이익!”
그녀는 결국 나를 잡은 손을 놓았다. 그러고는 토라져 버린 건지 고개를 팩 돌려버렸다. 그리고 우리는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다. 내가 잘못 본게 아니라면 그녀의 어깨는 약간씩 들썩이고 있었다.
“아...저기 세디나?”
“········”
“으음...미안해, 울지 마...화 많이··”
“시끄러워요!”
“····”
그녀가 이렇게 화내는 건 처음이다.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웃음을 잃지 않던 그녀인데 지금은 눈물마저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눈물을 보던 나는 움찔하여 아무 말도 못했다.
“만날 자기 하고 싶은 대로야! 당신이 제일 중요해요? 당신이 최고예요? 그럼 왜 날 만난 거예요? 왜 날 사랑한다고 말한 거예요? 당신이 제일 중요하면서! 왜 날 이렇게 만드는데요!”
“그··그건”
“됐어요. 이젠 싫어요. 당신에게 이리 저리 휘둘리는 건 질렸어요! 짜증 난다구요.”
그대로 그녀는 벌떡 일어나 달려갔다. 순간 멍 해져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난 망연자실 앉아만 있었다. 때는 해가 지는 저녁 이었고 싸늘한 바람이 나를 감쌌다. 잔뜩 쪼그려 무릎에 머리를 묻고 있던 나는 손을 펴 얼음을 만들었다. 그리고 얼음들이 굳어 가며 만들어 진건 반짝이고 투명한 반지. 오늘은 반드시 말하려고 했는데. 일이 꼬였다.
“젠장···”
-파삭
얼음 반지가 내 손에서 깨지며 흩날렸다. 그리고 내 눈에서 흐른 눈물도 함께 흩날렸다.
#
“자아! 오늘은 세디나 그레이 양과 뮤티스 클라이 군의 영원을 맹세하는 날 입니다.”
-와아아아아
하얀 면사포를 쓰고 있어 무슨 얼굴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세디나. 그리고 그녀의 옆에 서서 연신 히죽거리는 뮤티스.
그녀가 못보게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그녀를 쳐다 보고 있다. 그녀를 좀더 가까이서 보길 원해 얼음으로 렌즈를 만들어 그녀를 더운 크게 봤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답다. 나에게만 보여주던 미소를. 나만을 만져주던 그 손을. 빼앗겼다.
저런 보잘 것 없는 멍청한 수컷에게 빼앗겼다.
“자..그럼 두분은 맹세의 키스를..”
수줍은 듯 고개를 떨어뜨리는 그녀. 흥분으로 떨리는 손을 겨우 진정 시키며 그녀의 볼을 잡은 후 입술을 포개는 뮤티스.
언젠가는 헤어져야할 사랑이었지만 이런 식의 이별을 바란 건 아니었다. 언젠가는 후회 할걸 알고 있었지만 이런 후회는 싫었다.
눈물 때문에 앞이 보이질 않는다. 그리고 그대로 나는 정신을 잃는다.
그리고 날개가 없는 난 떨어진다. 한 마리 나비 이고 싶었던 나는 떨어진다.
‘그녀‘라는 꽃을 슬프게 한 나는 죄인이다.
#
내가 일어나 처음 본 곳은 지옥이었다. 차갑게 얼어버린 여러 사람들의 피. 여기저기 삐죽삐죽 솟아나 사람들을 꽤 뚫고 있는 얼음 기둥들. 그 중에 제일 참혹한 뮤티스의 시신. 머리는 얼음 덩어리로 으깨지고 팔 다리는 날카로운 무언가에 의해 잘려져 나갔다. 배는 뭐에 찔렸는지 구멍이 열개도 넘어 보였고 곳곳에서는 창자가 삐져나와 있었다.
“우..우읍!”
처음 보는 낯선 광경에 나는 그대로 안에 있던 것을 게워냈다.
한참을 그러다 문득 시선이 나의 왼쪽으로 갔다 그곳엔···그녀가 있었다. 얼어버린 채로. 커다란 얼음 감옥에 갇혀 얼어버린 그녀가 있었다.
“아....아흑..”
웃고 있다. 그녀는 차디찬 얼음 속에 갇혀 웃고 있다. 얼음을 붙잡고 녹이려 했다. 두껍지만 녹이려 했다. 녹지 않는다. 얼음은 마치 만년설처럼 얼어붙어 그녀를 내보내지 않는다. 늦은 후회란 걸까. 아픔이란 이런 것일까. 말이 나오지 않는다. 입이 얼어붙었는지 말이 나오질 못한다. 목에 뭐가 걸린 듯 자꾸 꺽꺽거리기만 하고 전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눈에서 무엇이 그리 슬픈지 연신 눈물이 흐른다. 땅에 떨어질 때마다 촉촉이 젖어 드는 얼음. 하지만 역시 녹진 않는다.
“미안...많이 아팠지”
만질 순 없지만. 다가 갈순 없지만 그녀의 볼에 내 차가운 손을 대었다. 따듯함은 느껴지지 않는다. 이별 하리란건 알고 있었지만 싫다. 이제 그녀를 평생 간직하고 싶다. 평생 같이 웃고 싶다.
“다신 안 그럴게..꼬집어도 같이 안 꼬집을 테니까..”
손이 주르르 미끄러져 내린다. 미끄러지지 않으려 일부러 손톱을 세워 긁는다. 손톱이 빠질 때까지 그렇게 긁어 대었다.
“돌아와...돌아와...제발..돌아와...”
연신 얼음을 긁어대며 울부짖었다. 손가락이 아팠지만 그녀의 마음만큼은 아니리라.
눈물이 말랐지만 그녀는 이미 나 때문에 눈물이 말라 미소밖에 남은 게 없었으리라. 나에게 보여준 미소는 눈물 대신이었던 것이리라.
“돌아오란 말이야 이 바보야!”
얼음은 어느새 붉게 물들었고 그 안으로 보이는 그녀의 새하얀 드레스는 붉게 물든 듯 했다. 멍 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문득 얼음이 녹아 그녀의 눈 부분에서부터 흘러 내렸다.
손톱이 빠져 흉해지고 아픈 손 이었지만 손을 살며시 들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 주었다.
그녀가 더 이상 울지 않을 때까지 난 옆에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나. 여기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기다릴 것이다. 그녀가 일어나 나에게 아침 인사를 건넬 때까지.
지독한 악몽이 있던 밤 다음날에 맞이하는 상쾌한 아침이 고마운걸 알기에.
여기서 그녈 바라보며 살 것이다.
이게 나 겨울의 신이자 그녀의 노예 되기를 자청한 스히렌 즈 우인테르. 나와 그녀사이의 약속이다.
댓글 1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311 | [단편]파란지붕 | 케테스 | 2005.03.02 | 4286 |
| 310 | [단편]아마도 미래는 내 손에 | 케테스 | 2005.03.02 | 2917 |
| 309 | [단편]마지막 인사 | 케테스 | 2005.03.02 | 2472 |
| 308 | [상상연작 6회 이미지] [4] | 연緣 | 2005.02.27 | 2044 |
| 307 | the immotal king [3] | Long-Rifle | 2005.02.27 | 2610 |
| 306 | 배신 [1] | 넋 | 2005.02.26 | 2032 |
| 305 | [상상연작 5회] 판도라의 상자 [4] | 네모Dori | 2005.02.04 | 1975 |
| 304 | [장편]겨울이야기 5편 [2] | 케테스 | 2005.01.28 | 2127 |
| 303 | 기다림(수정) [4] | 네모Dori | 2005.01.20 | 1533 |
| 302 | [상상연작 4회] 다니 [5] | 네모Dori | 2005.01.11 | 1530 |
| 301 | ○●-- 붉은달빛 광이엄마 이야기 --●○ [1] | 잔혹한천사 | 2005.01.11 | 1788 |
| 300 | [상상연작 4회 이미지] [5] | 네모Dori | 2005.01.10 | 2544 |
| 299 | ○●-- 붉은달빛 프롤로그 --●○ [4] | 잔혹한천사 | 2005.01.09 | 1754 |
| 298 | 릴레이리플 시즌5 시작 [20] | 태성 | 2005.01.07 | 2087 |
| 297 | 릴레이 리플 시즌 4-2 [20] | 넋 | 2005.01.04 | 1605 |
| 296 | 아스타로스 전기 -프롤로그- [3] | 고구마 | 2005.01.04 | 1614 |
| 295 | 릴레이 리플 시즌4 [32] | Long-Rifle | 2004.12.28 | 2228 |
| 294 | [상상연작 3회] 약(藥) [3] | 넋 | 2004.12.28 | 1762 |
| 293 | 정령술사&소환술사 - 2 [4] | 악마_애기 | 2004.12.26 | 1626 |
| 292 | [상상연작 3회] 투쟁 [3] | 네모Dori | 2004.12.26 | 19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