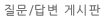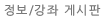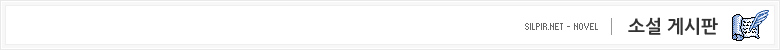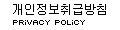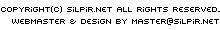최근 댓글
최근 댓글
비의 술사 외전
2005.04.21 17:50
비의 술사 외전
아레 력 176년 16고르드 31
슬픈 비가 내리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불렀다. 슬픈 비. 항상 나쁜 일이 있거나 불행한 일이 생기면 항상 내리는 이 파란색 끈적끈적한 비. 무슨 일이 생기려는 것일까. 아니면 이미 시작 되었는가.
아까부터 집 근처에서 기척이 느껴진다. 더럽지 않은. 그렇지만 결코 깨끗하지 않은 음울한 기운. 무엇인가. 이 슬픈 비의 날에 돌아다니는 불결한 생물들. 그건 설마....
일기는 그렇게 끝나 있었다. 무언가를 쓰려는 듯 길게 늘여져 있는 선이 보였지만 파란 얼룩만 있을 뿐 더 이상의 내용은 없었다. 이것으로 2개째... 2개의 일기 모두 아레력 176년 16고르드 31에 끝나 있었다. 무엇을 의미 하는가. 정말 슬픈 비 때문인가? 슬픈 비 에 일어난 일들은 무엇인가. 책상에 앉아 일기를 읽던 사내는 얕은 한숨을 쉬더니 옆에 있던 붉은 줄을 당겼다. 그리고는 일기장을 덮어 서재 책장에 꽂아 넣음과 동시에 복도와의 길을 막고 있던 문이 열리고는 그 사이로 13~15세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가 보였다.
“왜 또 부른 거야? 귀찮게.”
무도회에서나 쓸법한 그런 가면을 쓴 여자아이는 자신보다 적어도 8살을 많아 보이는 소년에게 다짜고짜 반말을 했다.
“슬픈 비. 혹시 아는가? 지금 읽고 있던 모든 일기들이 아레력 176년 16고르드 31에 끝났어. 하나같이 슬픈 비 때문이라고 하는데.”
소녀가 움찔거림과 같이 파란 색 머리카락과 흰색 레이스 달린 검은색 드레스가 찰랑 거렸다.
“내...내앞에서 그 예기는 꺼내지마. 다시는.”
소녀는 동요하고 있었다. 꼭 쥔 손에서는 땀이 났고 몸은 덜덜덜 떨렸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처럼 하염없이 흔들렸다.
“....”
소녀는 힘없는 걸음걸이로 조용히 나갔다. 멍하니 복도를 바라보던 사내는 몸을 돌려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 서 있었다. 검은색 머리 와 검은색 눈동자를 가진. 검은색 예복을 입고 붉은 무늬가 새겨져 있는 흰색 장갑을 낀 사내. 그가 눈을 감았다 다시 뜬 순간 그는 보았다. 붉게 물들어 광인의 눈을 연상 시키는 자신의 눈. 그는 흡족한 미소를 문채 다시 다른 일기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아레력 98 8티로 15
속죄의 비가 몇 달째 끊이지 않는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파랗고 끈적끈적한 비를 보면 절로 기분이 나빠진다.
파랗고 끈적끈적한 비? 슬픈 비와 똑같다. 하지만 어째서 이들은 속죄의 비라 부르는가.
사내는 놀라움이 가득한 눈으로 계속 읽어 내려갔다.
3달 전에는 이웃나라 토미라가 정체불명의 무언가에 의하여 멸망했다.
2달 전에는 바다가 갑자기 말라 버렸다.
1달 전에는 모든 구름들이 사라지고 하늘이 낮아졌다.
지금은 끊이지 않고 속죄의 비가 내린다.
과연 우리의 잘못은 뭐란 말인가...
일기는 흥미로웠다. 결국 속죄의 비나 슬픈 비는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 비가 내리는 날에는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정체불명의 ‘무언가’ 에 의해 나라는 멸망하고 바다가 말라 버린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무서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내는 점점 흥미를 느껴갔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알 수만 있다면. 슬픈 비의 정체를 알 수 있다면...’
-팔락
일기를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흠?”
전혀 다른 글씨체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다. 게다가 검붉은 색이라니. 기분 나쁘지 않은가.
창조주이시여 우리는 그대의 종입니다조심해서 걸어온 이 가시밭길의 끝은 겨우주신께서 만든 낙원이 아닌 어찌 이런 지옥 이란 말입니까우리를 인도 하소서 신이시여
리하마르 의 품에서 우리를 꺼내시어
죄와 벌을 받게 하소서 그리고 구원하소서.
용기 있는 자만이 용서를 받을 것이고
서있기 힘든 자는 부축해 주시나이다.
하늘아래 나 이렇게 맹세하니
소를 찾는 목동처럼 저를 찾으소서.
서쪽 땅 해가 지는 곳에 자비를 주소서.
“이..이게”
슬픈 비나 속죄의 비. 결국 신의 경고라는 뜻인가? 게다가 용서를 비는 자 안 비는 자 구별 없이 모두 죽인건가? 믿을 수가 없었다. 믿기지 않는 맘에 일기를 계속 펄럭거리며 뒤로 넘어갔다.
마지막장에 도착해 그는 무언가를 볼 수 있었다.
-지금 이 글을 누군가 본다면 그건 신께서 저희를 벌하신 다음 일겁니다.
지금 제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 누군지 알 길은 없지만 전 확신합니다.
지금 이리로 오십시오. 해가 지고 달이 뜨는 곳.
천사가 벌주고 바다가 갈라진 곳.
신이 약속하신 땅.
이곳으로 오십시오. 그대가 원하는
그대가 궁금해 하는
모든 것을 풀 수 있을 겁니다.-
“....”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심하게 흥분하면 눈물이 나는 버릇이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생각은 알 수 있었다.
“집사!”
그는 옷걸이에서 검은색 후드를 꺼내 쓴 뒤 그 옆에 세워져 있던 기다란 고목나무 스태프를 잡았다.
“부르셨습니까?”
“지금부터 이 집의 모든 관리는 너에게 맡긴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훌륭히 보관하고 있도록.”
그는 작은 가방을 꺼내 일기장 3권을 넣었다. 그리고 작은 지도와 그가 즐겨 쓰는 붉은 렌즈의 검은색 반테 안경도 함께 넣었다.
“알겠습니다.”
“내가 5년 이내에 돌아오지 않을 경우 바니샤 에게 모든 권리를 주어라. 그리고 그 후엔 나는 찾지 말고 잊어라. 이건 명령이다”
주인이 명령하고 있다. 그가 그를 섬긴지 5년이 되어가지만 지금껏 그는 명령 한 적이 없다. 항상 미소와 함께 부탁하던 그가 처음으로 명령을 내렸다.
집사는 놀란 표정을 지우고는 얼굴에 미소를 달고는 사내를 배웅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른다.
그가 정신이 나간채로 신의 동상 앞에서 울고 있다는 말도 있었고 아니면 사막에서 죽었다는 말도 있었다. 또 마법사들은 그가 그 어느 곳에서 신의 지식을 얻어 인간 세계에 싫증을 느껴 하늘로 올라갔다 말하고 있다.
누가 아는가. 그의 행방을.
그렇게 소문은 잠잠해졌고 그는 결국 죽은 걸로 결론이 났다,
소문이 사그라질 무렵, 마을엔 한 소년이 나타났는데 그 소년은 검은색 머리와 검은색 후드를 쓰고 있었으며 소년이 들기엔 너무 커 보이는 스태프와 가방을 매고 있었다.
소년의 눈은 깊고 어둡고 붉은색이었으며 그의 입은 항상 무언가를 중얼 거렸다. 마치 주문 같기도 했고 혹은 기도문 같기도 했다.
소년은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2년 전부터 빈집에 된 바니샤 디크리스 의 저택으로 들어갔다.
저택은 빈집 치고는 말끔 했으며 여전히 그 웅장함을 뽐내고 있었다.
“돌아왔어.”
소년은 낮게 말했다. 그리고 잘못 들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렴풋이 소녀의 목소리도 들린 듯 하였다
“늦었네?”
그리고 소년은 저택에서 나오지 않았다.
아레 력 176년 16고르드 31
슬픈 비가 내리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불렀다. 슬픈 비. 항상 나쁜 일이 있거나 불행한 일이 생기면 항상 내리는 이 파란색 끈적끈적한 비. 무슨 일이 생기려는 것일까. 아니면 이미 시작 되었는가.
아까부터 집 근처에서 기척이 느껴진다. 더럽지 않은. 그렇지만 결코 깨끗하지 않은 음울한 기운. 무엇인가. 이 슬픈 비의 날에 돌아다니는 불결한 생물들. 그건 설마....
일기는 그렇게 끝나 있었다. 무언가를 쓰려는 듯 길게 늘여져 있는 선이 보였지만 파란 얼룩만 있을 뿐 더 이상의 내용은 없었다. 이것으로 2개째... 2개의 일기 모두 아레력 176년 16고르드 31에 끝나 있었다. 무엇을 의미 하는가. 정말 슬픈 비 때문인가? 슬픈 비 에 일어난 일들은 무엇인가. 책상에 앉아 일기를 읽던 사내는 얕은 한숨을 쉬더니 옆에 있던 붉은 줄을 당겼다. 그리고는 일기장을 덮어 서재 책장에 꽂아 넣음과 동시에 복도와의 길을 막고 있던 문이 열리고는 그 사이로 13~15세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가 보였다.
“왜 또 부른 거야? 귀찮게.”
무도회에서나 쓸법한 그런 가면을 쓴 여자아이는 자신보다 적어도 8살을 많아 보이는 소년에게 다짜고짜 반말을 했다.
“슬픈 비. 혹시 아는가? 지금 읽고 있던 모든 일기들이 아레력 176년 16고르드 31에 끝났어. 하나같이 슬픈 비 때문이라고 하는데.”
소녀가 움찔거림과 같이 파란 색 머리카락과 흰색 레이스 달린 검은색 드레스가 찰랑 거렸다.
“내...내앞에서 그 예기는 꺼내지마. 다시는.”
소녀는 동요하고 있었다. 꼭 쥔 손에서는 땀이 났고 몸은 덜덜덜 떨렸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처럼 하염없이 흔들렸다.
“....”
소녀는 힘없는 걸음걸이로 조용히 나갔다. 멍하니 복도를 바라보던 사내는 몸을 돌려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 서 있었다. 검은색 머리 와 검은색 눈동자를 가진. 검은색 예복을 입고 붉은 무늬가 새겨져 있는 흰색 장갑을 낀 사내. 그가 눈을 감았다 다시 뜬 순간 그는 보았다. 붉게 물들어 광인의 눈을 연상 시키는 자신의 눈. 그는 흡족한 미소를 문채 다시 다른 일기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아레력 98 8티로 15
속죄의 비가 몇 달째 끊이지 않는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파랗고 끈적끈적한 비를 보면 절로 기분이 나빠진다.
파랗고 끈적끈적한 비? 슬픈 비와 똑같다. 하지만 어째서 이들은 속죄의 비라 부르는가.
사내는 놀라움이 가득한 눈으로 계속 읽어 내려갔다.
3달 전에는 이웃나라 토미라가 정체불명의 무언가에 의하여 멸망했다.
2달 전에는 바다가 갑자기 말라 버렸다.
1달 전에는 모든 구름들이 사라지고 하늘이 낮아졌다.
지금은 끊이지 않고 속죄의 비가 내린다.
과연 우리의 잘못은 뭐란 말인가...
일기는 흥미로웠다. 결국 속죄의 비나 슬픈 비는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 비가 내리는 날에는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정체불명의 ‘무언가’ 에 의해 나라는 멸망하고 바다가 말라 버린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무서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내는 점점 흥미를 느껴갔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알 수만 있다면. 슬픈 비의 정체를 알 수 있다면...’
-팔락
일기를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흠?”
전혀 다른 글씨체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다. 게다가 검붉은 색이라니. 기분 나쁘지 않은가.
창조주이시여 우리는 그대의 종입니다조심해서 걸어온 이 가시밭길의 끝은 겨우주신께서 만든 낙원이 아닌 어찌 이런 지옥 이란 말입니까우리를 인도 하소서 신이시여
리하마르 의 품에서 우리를 꺼내시어
죄와 벌을 받게 하소서 그리고 구원하소서.
용기 있는 자만이 용서를 받을 것이고
서있기 힘든 자는 부축해 주시나이다.
하늘아래 나 이렇게 맹세하니
소를 찾는 목동처럼 저를 찾으소서.
서쪽 땅 해가 지는 곳에 자비를 주소서.
“이..이게”
슬픈 비나 속죄의 비. 결국 신의 경고라는 뜻인가? 게다가 용서를 비는 자 안 비는 자 구별 없이 모두 죽인건가? 믿을 수가 없었다. 믿기지 않는 맘에 일기를 계속 펄럭거리며 뒤로 넘어갔다.
마지막장에 도착해 그는 무언가를 볼 수 있었다.
-지금 이 글을 누군가 본다면 그건 신께서 저희를 벌하신 다음 일겁니다.
지금 제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 누군지 알 길은 없지만 전 확신합니다.
지금 이리로 오십시오. 해가 지고 달이 뜨는 곳.
천사가 벌주고 바다가 갈라진 곳.
신이 약속하신 땅.
이곳으로 오십시오. 그대가 원하는
그대가 궁금해 하는
모든 것을 풀 수 있을 겁니다.-
“....”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심하게 흥분하면 눈물이 나는 버릇이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생각은 알 수 있었다.
“집사!”
그는 옷걸이에서 검은색 후드를 꺼내 쓴 뒤 그 옆에 세워져 있던 기다란 고목나무 스태프를 잡았다.
“부르셨습니까?”
“지금부터 이 집의 모든 관리는 너에게 맡긴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훌륭히 보관하고 있도록.”
그는 작은 가방을 꺼내 일기장 3권을 넣었다. 그리고 작은 지도와 그가 즐겨 쓰는 붉은 렌즈의 검은색 반테 안경도 함께 넣었다.
“알겠습니다.”
“내가 5년 이내에 돌아오지 않을 경우 바니샤 에게 모든 권리를 주어라. 그리고 그 후엔 나는 찾지 말고 잊어라. 이건 명령이다”
주인이 명령하고 있다. 그가 그를 섬긴지 5년이 되어가지만 지금껏 그는 명령 한 적이 없다. 항상 미소와 함께 부탁하던 그가 처음으로 명령을 내렸다.
집사는 놀란 표정을 지우고는 얼굴에 미소를 달고는 사내를 배웅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른다.
그가 정신이 나간채로 신의 동상 앞에서 울고 있다는 말도 있었고 아니면 사막에서 죽었다는 말도 있었다. 또 마법사들은 그가 그 어느 곳에서 신의 지식을 얻어 인간 세계에 싫증을 느껴 하늘로 올라갔다 말하고 있다.
누가 아는가. 그의 행방을.
그렇게 소문은 잠잠해졌고 그는 결국 죽은 걸로 결론이 났다,
소문이 사그라질 무렵, 마을엔 한 소년이 나타났는데 그 소년은 검은색 머리와 검은색 후드를 쓰고 있었으며 소년이 들기엔 너무 커 보이는 스태프와 가방을 매고 있었다.
소년의 눈은 깊고 어둡고 붉은색이었으며 그의 입은 항상 무언가를 중얼 거렸다. 마치 주문 같기도 했고 혹은 기도문 같기도 했다.
소년은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2년 전부터 빈집에 된 바니샤 디크리스 의 저택으로 들어갔다.
저택은 빈집 치고는 말끔 했으며 여전히 그 웅장함을 뽐내고 있었다.
“돌아왔어.”
소년은 낮게 말했다. 그리고 잘못 들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렴풋이 소녀의 목소리도 들린 듯 하였다
“늦었네?”
그리고 소년은 저택에서 나오지 않았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311 | [단편]파란지붕 | 케테스 | 2005.03.02 | 4286 |
| 310 | [단편]아마도 미래는 내 손에 | 케테스 | 2005.03.02 | 2917 |
| 309 | [단편]마지막 인사 | 케테스 | 2005.03.02 | 2472 |
| 308 | [상상연작 6회 이미지] [4] | 연緣 | 2005.02.27 | 2044 |
| 307 | the immotal king [3] | Long-Rifle | 2005.02.27 | 2610 |
| 306 | 배신 [1] | 넋 | 2005.02.26 | 2032 |
| 305 | [상상연작 5회] 판도라의 상자 [4] | 네모Dori | 2005.02.04 | 1975 |
| 304 | [장편]겨울이야기 5편 [2] | 케테스 | 2005.01.28 | 2127 |
| 303 | 기다림(수정) [4] | 네모Dori | 2005.01.20 | 1533 |
| 302 | [상상연작 4회] 다니 [5] | 네모Dori | 2005.01.11 | 1530 |
| 301 | ○●-- 붉은달빛 광이엄마 이야기 --●○ [1] | 잔혹한천사 | 2005.01.11 | 1788 |
| 300 | [상상연작 4회 이미지] [5] | 네모Dori | 2005.01.10 | 2544 |
| 299 | ○●-- 붉은달빛 프롤로그 --●○ [4] | 잔혹한천사 | 2005.01.09 | 1754 |
| 298 | 릴레이리플 시즌5 시작 [20] | 태성 | 2005.01.07 | 2087 |
| 297 | 릴레이 리플 시즌 4-2 [20] | 넋 | 2005.01.04 | 1605 |
| 296 | 아스타로스 전기 -프롤로그- [3] | 고구마 | 2005.01.04 | 1614 |
| 295 | 릴레이 리플 시즌4 [32] | Long-Rifle | 2004.12.28 | 2228 |
| 294 | [상상연작 3회] 약(藥) [3] | 넋 | 2004.12.28 | 1762 |
| 293 | 정령술사&소환술사 - 2 [4] | 악마_애기 | 2004.12.26 | 1626 |
| 292 | [상상연작 3회] 투쟁 [3] | 네모Dori | 2004.12.26 | 19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