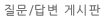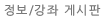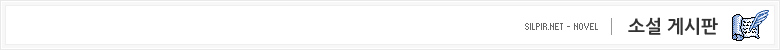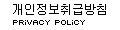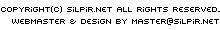최근 댓글
최근 댓글
Silence Rhapsody <part.1> prologue - 1
2004.01.10 21:30
Silence Rhapsody <part.1> prologue - 1
첫째, 접시를 닦는다. 둘째, 여관의 카운터로 나간다. 셋째, 손님을 받는다. 이때
손님의 경제력을 올바르게 측정하여 떼이는 돈을 최소화한다. 넷째, 식사가 끝
난 테이블은 깨끗하게 정리한다. 팁은 꼬박꼬박 챙기는 것이 관건. 다섯째, 테이
블의 손님이 모두 사라지면 위층의 방을 일일이 점검한다. 날아버린 놈이 있으
면 지상 끝까지 따라가 돈을 받는다. 여섯째, 점검이 끝나면 카운터 뒤에 있는
방에서 잔다. 반복, 반복, 반복.
“……비운의 소녀 네프의 일과랍니다. 말 그대로 반복일 뿐이예요. 심심해.”
여관을 차린다는 그녀의 아버지를 따라 여관업에 종사한 것이 벌써 7년. 무슨
일이던지 서비스업은 3년만 넘어가도흔히 말하는 ‘득업(得業)’ 의 경지에 다다
르는 법이다. 하물며 7년이라면 ‘득업’ 뿐이랴!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항상
같은 일과만을 반복하는 그녀에게 있어서 일상을 깨는 요소는 귀찮음이 아니라
반가움이었다.
“저기,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네프는 ‘손님’ 의 외형을 찬찬히 살폈다. 외모, 사춘기에 접어든 네프
의 취향에는 충분히 합격, 그러나 직업정신에 투철한 직업인(職業人) 네프의 취
향에는 여지없이 불합격. 복장, 사춘기 소녀도 여관직원 소녀도 불합격에 한표.
저 추레한 로브는 뭐람? 털면 먼지가 사방 3m를 채우겠어.
무언가 물어보기 위해 입을 떼려던 손님은 잠시 고개를 갸우뚱했다. 카운터에
앉아있는 소녀가 자신을 계속 훑어보고 있는 탓이었다. 한참 손님에 대해 품평
회를 진행하던 네프는 그와 눈이 마주치자 ‘힉’ 하고 숨을 들이쉬었다.
“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어떤 여자가 오지 않았습니까? 정신을
잃은 사람을 들춰업은 상태였는데.”
“글쎄요. 전 어제까지 아파서 집에 있었거든요. 아버지나 그때 근무했던 세미에
게 물어보세요. 세미는 우리 여관에서 왼쪽으로 세번째에 살아요.”
“그런가요? 흠……. 아버님과 만나고 싶습니다만. 아니, 그럴 필요는 없겠군요.
이 편지를 아버님에게 전해주십시오.”
네프는 남자가 내민 편지를 받아들었다. 편지의 겉면 상단부에는 ‘세르하 메디
치’ 라고 쓰여 있었고, 하단부에는 ‘나시사 샤르코프’ 라고 쓰여 있었다. 그 외에
는 무늬조차 없었다.
끼이익-
“아버지? 저예요.”
“……노크와 묻기는 문 밖에서 하는 거란다. 무슨 일이냐?”
봉투를 뜯지 않고 내용을 보기 위해 정신없이 편지를 들여다보던 네프는, 자신
이 문조차 두드리지 않고 들어왔다는 사실에 혀를 빼꼼 내밀었다.
“칫. 어떤 분이 아버지께 이 편지를 갖다드리래요.”
“그러냐? 어디보자…….”
네프의 아버지는 천천히 편지를 끄집어내며 읽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편지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으며, 나중에는 얼굴색마
저 붉그락푸르락하게 변해버렸다.
“아, 아버지?”
“……네프야. 지금 세르하 녀석에게 가서, 208호에 있는 환자를 3시간 이내에
내보내지 않는다면 내 사냥총에 죽·는·다·고 말하려무나.”
그녀의 아버지는 나름대로 인자하게 말하려고 노력한 듯하지만, 네프의 눈에는
거의 터지기 직전으로 보였으며, 마지막 ‘죽는다고’ 의 대목에서는 살기마저 느
껴졌다.
‘그런데 세르하가 누구지? 아까 그 손님의 이름인가?’
네프가 총총걸음으로 방을 빠져나가면서 한 마지막 생각이었다. 콰당, 하고 문
이 닫히자마자 네프의 아버지는 쌓였던 분노를 일시에 폭발시키며 편지를 찢어
버렸다.
“크아악! 약값에 음식값에 방값이 얼만데, 그걸 공짜로 해달라고? 나시사 이것
이 드디어 미쳤나?! 머리에 바람구멍을 시원하게 내버려야……!”
방음시설이 제대로 된 탓에 그가 터트린 분노의 함성은 네프에게까지 들리지 않
았다. 그저 어디서 화분이 굴러떨어졌나, 했을 뿐이다. 행여나 늦을까봐 달음박
질로 세르하에게 다가간 그녀는 아버지의 당부를 하나도 잊지 않고 전해주었다.
“208호에 찾는 분이 계시는데요, 3시간 이내에 환자분과 손님께서 나가지 않으
면 아버지의 사냥총으로 죽여버리시겠답니다.”
“……아하하, 예.”
허탈하게 웃으며 이층에 올라간 세르하는 조그마한 나무판에 금박으로 '208'
이라 새겨진 방을 찾아내었다. 이층에서도 상당히 구석진 방이었다. 허탈하
게나마 미소를 띠우고 있던 그는 사람이 달라보일 정도로 표정을 굳히며 문을
열었다.
끼이익-
황량하게 비워진 방에는 달랑 침대 하나와 의자만이 놓여져 있었다. 그리고 침
대에는 세르하가 찾던 ‘환자’ 가 누워 있었다.
“아직도 일어나지 못했나. 짐덩어리.”
세르하는 의자를 침대 옆으로 끌어놓고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조금의 주저함
도 없이 주먹으로 환자의 – 대충 짐작컨대 10대 후반의 소년으로 보이는 - 머리
를 후려갈겼다.
퍼억-!
“아, 아야!”
……방법이야 어쨌든 효과는 탁월했다.
찡그리지만 않았다면 – 원인 제공자는 이미 기억의 저편 – 계집아이처럼 상당
히 예쁘장한 얼굴이었다. 이 ‘짐덩어리’ 를 맡긴 사람에게 편지로 미리 언질을
받지 못했다면 한번쯤 성별을 의심했을 터이다.
“누구예요? 갑자기 들어와서 주먹질을…… 아야!”
따악-!
다시금 소년의 이마에 뜨거운 주먹이 작렬했다. 세르하는 주먹을 쓰다듬으며 여
전히 차가운 얼굴로 입을 열었다.
“이름, 출신지, 나이 등등 기억나는 신상명세는 모조리 대. 쓸데없는 헛소리의
첨부에 대한 대가는 크다. 지금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으니 알아서 하도록.”
“히잉……, 몰라요.”
따악-!
“다시. 기억나는 건 모조리 대라. 말했듯이 헛소리에 대한 대가는 크다.”
“진짜 몰라요…….”
따악-!
“마지막이다. 기억나는 건 모조리 말해.”
“모른다구요! 다짜고짜 들어와서 무슨 짓거…….”
따아악-!
“정말 아무것도 모르나?”
“모른다구요……, 히잉…….”
연거푸 네 대 – 특히 마지막에 작렬했던 경쾌한 딱밤 – 를 얻어맞은 소년은 발갛
게 부어오른 이마를 부여잡으며 끙끙대었다. 그런 그를 차갑게 응시하던 세르하
가 말했다.
“정말이군. 나시사가 편지에서 기억상실이라고 말했지. 20년 가까이 살아오면
서 기억상실은 처음 봤다. 신기해서 그랬던 것뿐이니 모쪼록 섭섭한 마음은 버
리길 바란다.”
“이익……!”
첫째, 접시를 닦는다. 둘째, 여관의 카운터로 나간다. 셋째, 손님을 받는다. 이때
손님의 경제력을 올바르게 측정하여 떼이는 돈을 최소화한다. 넷째, 식사가 끝
난 테이블은 깨끗하게 정리한다. 팁은 꼬박꼬박 챙기는 것이 관건. 다섯째, 테이
블의 손님이 모두 사라지면 위층의 방을 일일이 점검한다. 날아버린 놈이 있으
면 지상 끝까지 따라가 돈을 받는다. 여섯째, 점검이 끝나면 카운터 뒤에 있는
방에서 잔다. 반복, 반복, 반복.
“……비운의 소녀 네프의 일과랍니다. 말 그대로 반복일 뿐이예요. 심심해.”
여관을 차린다는 그녀의 아버지를 따라 여관업에 종사한 것이 벌써 7년. 무슨
일이던지 서비스업은 3년만 넘어가도흔히 말하는 ‘득업(得業)’ 의 경지에 다다
르는 법이다. 하물며 7년이라면 ‘득업’ 뿐이랴!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항상
같은 일과만을 반복하는 그녀에게 있어서 일상을 깨는 요소는 귀찮음이 아니라
반가움이었다.
“저기,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네프는 ‘손님’ 의 외형을 찬찬히 살폈다. 외모, 사춘기에 접어든 네프
의 취향에는 충분히 합격, 그러나 직업정신에 투철한 직업인(職業人) 네프의 취
향에는 여지없이 불합격. 복장, 사춘기 소녀도 여관직원 소녀도 불합격에 한표.
저 추레한 로브는 뭐람? 털면 먼지가 사방 3m를 채우겠어.
무언가 물어보기 위해 입을 떼려던 손님은 잠시 고개를 갸우뚱했다. 카운터에
앉아있는 소녀가 자신을 계속 훑어보고 있는 탓이었다. 한참 손님에 대해 품평
회를 진행하던 네프는 그와 눈이 마주치자 ‘힉’ 하고 숨을 들이쉬었다.
“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어떤 여자가 오지 않았습니까? 정신을
잃은 사람을 들춰업은 상태였는데.”
“글쎄요. 전 어제까지 아파서 집에 있었거든요. 아버지나 그때 근무했던 세미에
게 물어보세요. 세미는 우리 여관에서 왼쪽으로 세번째에 살아요.”
“그런가요? 흠……. 아버님과 만나고 싶습니다만. 아니, 그럴 필요는 없겠군요.
이 편지를 아버님에게 전해주십시오.”
네프는 남자가 내민 편지를 받아들었다. 편지의 겉면 상단부에는 ‘세르하 메디
치’ 라고 쓰여 있었고, 하단부에는 ‘나시사 샤르코프’ 라고 쓰여 있었다. 그 외에
는 무늬조차 없었다.
끼이익-
“아버지? 저예요.”
“……노크와 묻기는 문 밖에서 하는 거란다. 무슨 일이냐?”
봉투를 뜯지 않고 내용을 보기 위해 정신없이 편지를 들여다보던 네프는, 자신
이 문조차 두드리지 않고 들어왔다는 사실에 혀를 빼꼼 내밀었다.
“칫. 어떤 분이 아버지께 이 편지를 갖다드리래요.”
“그러냐? 어디보자…….”
네프의 아버지는 천천히 편지를 끄집어내며 읽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편지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으며, 나중에는 얼굴색마
저 붉그락푸르락하게 변해버렸다.
“아, 아버지?”
“……네프야. 지금 세르하 녀석에게 가서, 208호에 있는 환자를 3시간 이내에
내보내지 않는다면 내 사냥총에 죽·는·다·고 말하려무나.”
그녀의 아버지는 나름대로 인자하게 말하려고 노력한 듯하지만, 네프의 눈에는
거의 터지기 직전으로 보였으며, 마지막 ‘죽는다고’ 의 대목에서는 살기마저 느
껴졌다.
‘그런데 세르하가 누구지? 아까 그 손님의 이름인가?’
네프가 총총걸음으로 방을 빠져나가면서 한 마지막 생각이었다. 콰당, 하고 문
이 닫히자마자 네프의 아버지는 쌓였던 분노를 일시에 폭발시키며 편지를 찢어
버렸다.
“크아악! 약값에 음식값에 방값이 얼만데, 그걸 공짜로 해달라고? 나시사 이것
이 드디어 미쳤나?! 머리에 바람구멍을 시원하게 내버려야……!”
방음시설이 제대로 된 탓에 그가 터트린 분노의 함성은 네프에게까지 들리지 않
았다. 그저 어디서 화분이 굴러떨어졌나, 했을 뿐이다. 행여나 늦을까봐 달음박
질로 세르하에게 다가간 그녀는 아버지의 당부를 하나도 잊지 않고 전해주었다.
“208호에 찾는 분이 계시는데요, 3시간 이내에 환자분과 손님께서 나가지 않으
면 아버지의 사냥총으로 죽여버리시겠답니다.”
“……아하하, 예.”
허탈하게 웃으며 이층에 올라간 세르하는 조그마한 나무판에 금박으로 '208'
이라 새겨진 방을 찾아내었다. 이층에서도 상당히 구석진 방이었다. 허탈하
게나마 미소를 띠우고 있던 그는 사람이 달라보일 정도로 표정을 굳히며 문을
열었다.
끼이익-
황량하게 비워진 방에는 달랑 침대 하나와 의자만이 놓여져 있었다. 그리고 침
대에는 세르하가 찾던 ‘환자’ 가 누워 있었다.
“아직도 일어나지 못했나. 짐덩어리.”
세르하는 의자를 침대 옆으로 끌어놓고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조금의 주저함
도 없이 주먹으로 환자의 – 대충 짐작컨대 10대 후반의 소년으로 보이는 - 머리
를 후려갈겼다.
퍼억-!
“아, 아야!”
……방법이야 어쨌든 효과는 탁월했다.
찡그리지만 않았다면 – 원인 제공자는 이미 기억의 저편 – 계집아이처럼 상당
히 예쁘장한 얼굴이었다. 이 ‘짐덩어리’ 를 맡긴 사람에게 편지로 미리 언질을
받지 못했다면 한번쯤 성별을 의심했을 터이다.
“누구예요? 갑자기 들어와서 주먹질을…… 아야!”
따악-!
다시금 소년의 이마에 뜨거운 주먹이 작렬했다. 세르하는 주먹을 쓰다듬으며 여
전히 차가운 얼굴로 입을 열었다.
“이름, 출신지, 나이 등등 기억나는 신상명세는 모조리 대. 쓸데없는 헛소리의
첨부에 대한 대가는 크다. 지금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으니 알아서 하도록.”
“히잉……, 몰라요.”
따악-!
“다시. 기억나는 건 모조리 대라. 말했듯이 헛소리에 대한 대가는 크다.”
“진짜 몰라요…….”
따악-!
“마지막이다. 기억나는 건 모조리 말해.”
“모른다구요! 다짜고짜 들어와서 무슨 짓거…….”
따아악-!
“정말 아무것도 모르나?”
“모른다구요……, 히잉…….”
연거푸 네 대 – 특히 마지막에 작렬했던 경쾌한 딱밤 – 를 얻어맞은 소년은 발갛
게 부어오른 이마를 부여잡으며 끙끙대었다. 그런 그를 차갑게 응시하던 세르하
가 말했다.
“정말이군. 나시사가 편지에서 기억상실이라고 말했지. 20년 가까이 살아오면
서 기억상실은 처음 봤다. 신기해서 그랬던 것뿐이니 모쪼록 섭섭한 마음은 버
리길 바란다.”
“이익……!”
댓글 2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51 | 운명 (0) 프롤로그 - 싼타군 장편 판타지 소설 | Santape99 | 2004.01.12 | 1057 |
| 50 | 미친엘프의 무기사전 4화 -뱀파이어의 복수Revenge of Vampire- [4] | 미친엘프 | 2004.01.12 | 1656 |
| 49 | 無[7] [2] | k-j-h | 2004.01.11 | 1331 |
| 48 | 고구마의 무기도감 1page.... [4] | 고구마 | 2004.01.11 | 1817 |
| 47 | **죽지 않는 이야기[1]** [3] | ☆慤.撚.童.子★ | 2004.01.11 | 1264 |
| 46 | 미친엘프의 무기사전 3화 -울어라몽둥이Do Cry Stick??- [3] | 미친엘프 | 2004.01.11 | 2303 |
| 45 | 언제나 같은 풍경2 [2] | 나그네 | 2004.01.11 | 1055 |
| 44 | Silence Rhapsody <part.1> prologue - 2 [2] | 세이버 | 2004.01.10 | 1131 |
| » | Silence Rhapsody <part.1> prologue - 1 [2] | 세이버 | 2004.01.10 | 1244 |
| 42 | (2-4) 그녀와의 하룻밤.. (유치원) [3] | ºㅁº)づ | 2004.01.10 | 1768 |
| 41 |
Unknown 프롤로그 뒤 나올 인물 소개란.
[2] | 반 | 2004.01.10 | 249 |
| 40 | 미친엘프의 무기사전 2화 - 뮤직소드Music Sword [7] | 미친엘프 | 2004.01.10 | 2150 |
| 39 |
Unknown(10)
[1] | 반 | 2004.01.10 | 162 |
| 38 | 제목 미상의글 [6] [3] | 고구마 | 2004.01.10 | 1204 |
| 37 |
Unknown(9)
[1] | 반 | 2004.01.10 | 165 |
| 36 | 無[6] [2] | k-j-h | 2004.01.10 | 1259 |
| 35 | 언제나 같은 풍경... [1] | 나그네 | 2004.01.09 | 1229 |
| 34 |
Unknown(8)
[1] | 반 | 2004.01.09 | 150 |
| 33 | (2-3) 그녀와의 리조트 1박2일..(유치원) [5] | ºㅁº)づ | 2004.01.09 | 1576 |
| 32 | 無[5](수정 끝) | k-j-h | 2004.01.09 | 13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