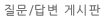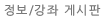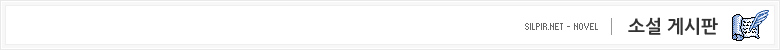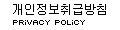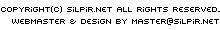최근 댓글
최근 댓글
(1)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속에서..
2004.01.27 09:42
터벅 터벅 걸어간 곳은 내 쉴곳.
아무도 없는 이 곳은 나의 쉴곳.
혼자 적막히 앉아서 천장을 보며 또 한숨을 쉬며..
또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다.
언젠가는 끝남이 있고 시작이 있을거라는 책속의 말들은
그저 책속에서 맴돌뿐이다.
나는 이곳에서 또 다시 하루를 맞이하고 또 이렇게 끝내고있다.
창에 비치는 형광등은 자기 수명이 끝나가는건지 계속 흔들리고 있다.
" ...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다만 이렇게 흘러갈뿐이야.. "
갈증이 일어날듯 내 목소리는 그렇게 가라앉아있다.
갑자기 두려워졌다.. 아니 늘상 두려워한건지도 모른다
이렇게 시간은 흘러가는데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이대로 늙어가고 죽어가는것인가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기억해주는 이 없이 그렇게 죽어가야하는건가?
"... 가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지 않으면 추락한다라.. "
자조섞인 말로 몸을 일으켜세우고 그렇게 밖으로 터벅터벅 나섰다.
한 겨울의 날씨가 그나마 풀렸다지만
입김이 날 정도로 추운 날씨였다
"어디로가지..?"
추위도 추위지만 ..그다지 갈만한곳도 없었다.
그냥.. 무작정 걸어갔다.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든 어디에서 끊어지든..
그런거완 상관없이 단지 길을 걸으면서 내가 뭘 해야할지 생각하고 싶었다.
가진것은 옷 몇벌과 자그마한 월셋집 방한칸.. 그리고.. 어머니의 땀과 피가 얼룩진 몇백만원정도..
문득 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은 한푼도 쓰지 않고 잘 간직해두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보니 어느샌 내가 태어나고 19년동안 자라왔던..
이 이름도 지어지지 않은 마을의 끝에.. 왔다
그리고.. 저 능선 뒷편으로 이어지는 저 길을 눈에 담아뒀다..
저 길로 내가 가리라고..
아무도 없는 이 곳은 나의 쉴곳.
혼자 적막히 앉아서 천장을 보며 또 한숨을 쉬며..
또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다.
언젠가는 끝남이 있고 시작이 있을거라는 책속의 말들은
그저 책속에서 맴돌뿐이다.
나는 이곳에서 또 다시 하루를 맞이하고 또 이렇게 끝내고있다.
창에 비치는 형광등은 자기 수명이 끝나가는건지 계속 흔들리고 있다.
" ...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다만 이렇게 흘러갈뿐이야.. "
갈증이 일어날듯 내 목소리는 그렇게 가라앉아있다.
갑자기 두려워졌다.. 아니 늘상 두려워한건지도 모른다
이렇게 시간은 흘러가는데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이대로 늙어가고 죽어가는것인가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기억해주는 이 없이 그렇게 죽어가야하는건가?
"... 가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지 않으면 추락한다라.. "
자조섞인 말로 몸을 일으켜세우고 그렇게 밖으로 터벅터벅 나섰다.
한 겨울의 날씨가 그나마 풀렸다지만
입김이 날 정도로 추운 날씨였다
"어디로가지..?"
추위도 추위지만 ..그다지 갈만한곳도 없었다.
그냥.. 무작정 걸어갔다.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든 어디에서 끊어지든..
그런거완 상관없이 단지 길을 걸으면서 내가 뭘 해야할지 생각하고 싶었다.
가진것은 옷 몇벌과 자그마한 월셋집 방한칸.. 그리고.. 어머니의 땀과 피가 얼룩진 몇백만원정도..
문득 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은 한푼도 쓰지 않고 잘 간직해두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보니 어느샌 내가 태어나고 19년동안 자라왔던..
이 이름도 지어지지 않은 마을의 끝에.. 왔다
그리고.. 저 능선 뒷편으로 이어지는 저 길을 눈에 담아뒀다..
저 길로 내가 가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