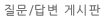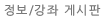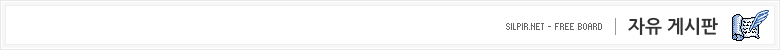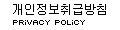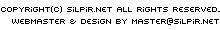최근 댓글
최근 댓글
Silence Rhapsody <part.1> prologue - 2
2004.01.10 21:31
Silence Rhapsody <part.1> prologue - 2
분노가 하늘을 넘어 우주까지 침범한 소년은 세르하에게 달려들었으나, 세르하
는 너무나 가볍게 그를 제압하고 방바닥에 던져버렸다. 볼썽사납게 바닥에 처박
힌 소년을 보며 세르하는 담담하게, 그리고 차갑게 입을 열었다.
“지금 네가 처한 상황이 인지되지 않나. 기억상실인가 뭔가에 의존하여 현실을
도피할 셈인가. 네 녀석은 길을 잃어버린 바보와 같단 말이다. 고장난 나침반이
라도 쥐어야 살 운명이 아니었나? 그렇지 않아?”
“…….”
“침묵은 긍정이라고 누가 우기더군. 나도 긍정으로 알아듣겠다. 내 이름은 세르
하 메디치. 전직 마법사였지만 누군가의 어거지로 네놈의 나침반이 되었으니 알
아서 활용하도록.”
“…….”
얼마간의 침묵이 이어졌다. 무언가 질문을 해야 하는데, 방금 전에 있었던 세르
하와의 광폭한 대담으로 인해 소년이 무척이나 겁을 먹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겨우 용기를 쥐어짜내 주저주저하며 물었다.
“……저기, 여긴 어디지?”
“스펜타 왕국 서부. 여기서 북서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에슈타르 제국령이다.
조금 자세하게 말한다면 여기는 ‘네아’ 라는 마을이고 이 여관은……, 모른다.”
“난 어디서 온 거야?”
“모르지. 나시사가 편지에서는 그저 ‘에슈타르 제국령 북부’ 라고만 적어놓았고,
정확한 위치는 알려주지 않았어. 나중에 나시사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아, 나시
사는 널 구해준 트레저 헌터(Treasure Hunter)다.”
“트레저 헌터가 뭔데?”
“대충 말하자면 도굴범.”
“헤에?”
처음의 어색함과는 달리, 소년이 물으면 세르하가 대답하고 그의 대답에서 모르
는 단어를 물어보고 하는 식으로 무척이나 원활한, 그러나 영양가가 빠진 대화
가 오랫동안 진행되었다. ‘마법사가 뭐야?’ , ‘이 침대보는 뭘로 만들어졌지?’ 하
는 하찮은 질문 등등. 마요네즈가 빠져나간 샐러드를 먹는 것처럼 진정 삶에 도
움이 되는 주제에서 겉돌던 소년은 드디어 ‘진지하고 중요한, 게다가 인생에까
지 도움이 되는’ 주제에 매우 가까이 접근해냈다.
“아, 내 이름은 뭐지?”
“네 이름? 나도 모른다. 나시사의 편지에도 없었고.”
“헤에……, 그럼 계속 ‘놈’ , ‘녀석’ , ‘너’ 라고 불려야 하나?”
“시끄럽다. 대충 이름을 지어줄 테니 닥치고 있어.”
세르하는 턱을 괴면서 생각에 빠져들었다. 사실, 처음 대화가 시작되었을 적부
터 그가 고민하던 문제는 바로 ‘이름’ 이었다. 언제까지고 ‘놈’ 혹은 ‘너’ 라고 부
를 수도 없는 일이었을 뿐더러 강아지처럼 적당히 ‘멍멍이’ 등등으로 붙여놓을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후, 좋아……. 응?”
방에 조그맣게 난 창문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누군가가 본다면 ‘노을 차암 멋있
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세르하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감상’ 이라는
시시콜콜한 것 따위는 애초부터 없었다. 그가 느낀 것은 단 하나, ‘생명의 위협’
이었다.
“이봐, 너.”
“응? 아직까지도 이름을 못 지었나?”
“닥쳐. 이건 너와 내가 동시에 처한 문제다. 짐이 있으면 들고 저 창문에서 뛰어
내려. 지금 당……!”
탕-!
“……이런.”
사냥총으로부터 힘있게 쏘아진 총알은 방의 벽을 거의 관통해 수줍게 얼굴을 내
밀고 있었다. 아직 총알이 뭔지 모르는 소년은 갸우뚱했고, 세르하는 쓰게 웃으
면서 창문을 열었다.
“시작이다.”
“뭐, 뭐야? 으아아-!”
쿠웅-!
소년의 둔부가 지면에 강렬한 키스마크를 남기는 소리와 함께 세르하도 창문에
서 뛰어내렸다. 그와 동시에 문이 벌컥, 열리면서 사냥총을 든 중년인이 뛰어들
었다.
“젠장……, 정확히 3시간이었는데! 다음에 내가 기필코 세르하, 나시사 이 연놈
들을 죽여버리겠어……. 빌어먹을!”
타앙-!
“후, 당신 인기 좋구만.”
밤하늘을 길게 가로지르는 총알을 보며, 세르하는 어릿어릿한 몸을 일으켰다.
그야 어느 정도 신체단련을 했고, 떨어질 때에 충격을 줄일 여유가 있었기 때문
에 금세 일어날 수 있었지만, 소년은 달랐다. 세르하 본인이 직접 집어던진 것이
다……, 라지만 소년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멀쩡했다.
“……미친.”
“내가 보기에 당신이 더 미쳤어. 아무리 급하다지만 사람을 떨어뜨려? 응?”
“시끄럽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배낭 – 아까의 비상(飛翔)으로 인해 너덜더덜해진 – 을 둘
러매면서 소년에게 손짓했다.
“아무런 부상이 없으면 일어나도록, 카엔시스.”
“응? 카엔시스가 누구야?”
“네 이름이다. ‘기억(記憶)’ 이라는 고대어지. 그냥 잃어버렸다는 뜻에서 로즈
(lose)라고 했는데 워낙 여자 이름처럼 들려서. 고대어로 지어진 이름에 감사해
라. 대륙 전체를 통틀어서 고대어를 아는 사람도 드물고 고대어로 이름지어진
사람도 드무니까.”
“쳇, 알아볼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 어감은 좋지만.”
“……닥쳐라.”
분노가 하늘을 넘어 우주까지 침범한 소년은 세르하에게 달려들었으나, 세르하
는 너무나 가볍게 그를 제압하고 방바닥에 던져버렸다. 볼썽사납게 바닥에 처박
힌 소년을 보며 세르하는 담담하게, 그리고 차갑게 입을 열었다.
“지금 네가 처한 상황이 인지되지 않나. 기억상실인가 뭔가에 의존하여 현실을
도피할 셈인가. 네 녀석은 길을 잃어버린 바보와 같단 말이다. 고장난 나침반이
라도 쥐어야 살 운명이 아니었나? 그렇지 않아?”
“…….”
“침묵은 긍정이라고 누가 우기더군. 나도 긍정으로 알아듣겠다. 내 이름은 세르
하 메디치. 전직 마법사였지만 누군가의 어거지로 네놈의 나침반이 되었으니 알
아서 활용하도록.”
“…….”
얼마간의 침묵이 이어졌다. 무언가 질문을 해야 하는데, 방금 전에 있었던 세르
하와의 광폭한 대담으로 인해 소년이 무척이나 겁을 먹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겨우 용기를 쥐어짜내 주저주저하며 물었다.
“……저기, 여긴 어디지?”
“스펜타 왕국 서부. 여기서 북서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에슈타르 제국령이다.
조금 자세하게 말한다면 여기는 ‘네아’ 라는 마을이고 이 여관은……, 모른다.”
“난 어디서 온 거야?”
“모르지. 나시사가 편지에서는 그저 ‘에슈타르 제국령 북부’ 라고만 적어놓았고,
정확한 위치는 알려주지 않았어. 나중에 나시사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아, 나시
사는 널 구해준 트레저 헌터(Treasure Hunter)다.”
“트레저 헌터가 뭔데?”
“대충 말하자면 도굴범.”
“헤에?”
처음의 어색함과는 달리, 소년이 물으면 세르하가 대답하고 그의 대답에서 모르
는 단어를 물어보고 하는 식으로 무척이나 원활한, 그러나 영양가가 빠진 대화
가 오랫동안 진행되었다. ‘마법사가 뭐야?’ , ‘이 침대보는 뭘로 만들어졌지?’ 하
는 하찮은 질문 등등. 마요네즈가 빠져나간 샐러드를 먹는 것처럼 진정 삶에 도
움이 되는 주제에서 겉돌던 소년은 드디어 ‘진지하고 중요한, 게다가 인생에까
지 도움이 되는’ 주제에 매우 가까이 접근해냈다.
“아, 내 이름은 뭐지?”
“네 이름? 나도 모른다. 나시사의 편지에도 없었고.”
“헤에……, 그럼 계속 ‘놈’ , ‘녀석’ , ‘너’ 라고 불려야 하나?”
“시끄럽다. 대충 이름을 지어줄 테니 닥치고 있어.”
세르하는 턱을 괴면서 생각에 빠져들었다. 사실, 처음 대화가 시작되었을 적부
터 그가 고민하던 문제는 바로 ‘이름’ 이었다. 언제까지고 ‘놈’ 혹은 ‘너’ 라고 부
를 수도 없는 일이었을 뿐더러 강아지처럼 적당히 ‘멍멍이’ 등등으로 붙여놓을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후, 좋아……. 응?”
방에 조그맣게 난 창문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누군가가 본다면 ‘노을 차암 멋있
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세르하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감상’ 이라는
시시콜콜한 것 따위는 애초부터 없었다. 그가 느낀 것은 단 하나, ‘생명의 위협’
이었다.
“이봐, 너.”
“응? 아직까지도 이름을 못 지었나?”
“닥쳐. 이건 너와 내가 동시에 처한 문제다. 짐이 있으면 들고 저 창문에서 뛰어
내려. 지금 당……!”
탕-!
“……이런.”
사냥총으로부터 힘있게 쏘아진 총알은 방의 벽을 거의 관통해 수줍게 얼굴을 내
밀고 있었다. 아직 총알이 뭔지 모르는 소년은 갸우뚱했고, 세르하는 쓰게 웃으
면서 창문을 열었다.
“시작이다.”
“뭐, 뭐야? 으아아-!”
쿠웅-!
소년의 둔부가 지면에 강렬한 키스마크를 남기는 소리와 함께 세르하도 창문에
서 뛰어내렸다. 그와 동시에 문이 벌컥, 열리면서 사냥총을 든 중년인이 뛰어들
었다.
“젠장……, 정확히 3시간이었는데! 다음에 내가 기필코 세르하, 나시사 이 연놈
들을 죽여버리겠어……. 빌어먹을!”
타앙-!
“후, 당신 인기 좋구만.”
밤하늘을 길게 가로지르는 총알을 보며, 세르하는 어릿어릿한 몸을 일으켰다.
그야 어느 정도 신체단련을 했고, 떨어질 때에 충격을 줄일 여유가 있었기 때문
에 금세 일어날 수 있었지만, 소년은 달랐다. 세르하 본인이 직접 집어던진 것이
다……, 라지만 소년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멀쩡했다.
“……미친.”
“내가 보기에 당신이 더 미쳤어. 아무리 급하다지만 사람을 떨어뜨려? 응?”
“시끄럽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배낭 – 아까의 비상(飛翔)으로 인해 너덜더덜해진 – 을 둘
러매면서 소년에게 손짓했다.
“아무런 부상이 없으면 일어나도록, 카엔시스.”
“응? 카엔시스가 누구야?”
“네 이름이다. ‘기억(記憶)’ 이라는 고대어지. 그냥 잃어버렸다는 뜻에서 로즈
(lose)라고 했는데 워낙 여자 이름처럼 들려서. 고대어로 지어진 이름에 감사해
라. 대륙 전체를 통틀어서 고대어를 아는 사람도 드물고 고대어로 이름지어진
사람도 드무니까.”
“쳇, 알아볼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 어감은 좋지만.”
“……닥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