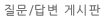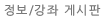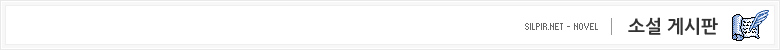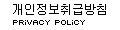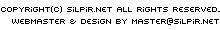최근 댓글
최근 댓글
기다림(수정)
2005.01.20 22:28

아침안개가 짙게 깔린 항구. 움직이는 사람들. 끼룩거리는 갈매기. 아직 태양은 바다 속에서 사랑의 밀어를 나누지만, 바다 저편, 서쪽 저 먼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바다의 짙은 짠 내를 깊숙이 품고 파수꾼에게로 향한다. 졸리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고, 저 먼 곳 안개 너머 바다를 바라보며 파수꾼은 일어난다. 찌푸려지는 눈살, 그리고 살며시 올라가는 입술. 항구도시 와이트의 아침이 밝는다.
“썬-크루-즈-”
아직 태양은 저 아래에서 바다와 함께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항구도시 와이트는 잠들지 않는다. 달빛조차 어두운 밤이라도 배들은 입항하고, 출항한다. 신선한 고기들은 어두컴컴한 새벽에 거래된다. 항구도시 와이트엔 모두가 잠든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북적거림도, 바다사나이들의 일. 항구도시라고 모든 사람이 배를 타고 살아가진 않으니까.
그리고 와이트에 단 한명밖에 없는 여자 대장장이 라메나 에겐, 항구로 가는 날은 한달에 단 이틀뿐. 그리고 그 이틀 중 하루가 바로 오늘이다.
아침안개를 태우는 태양빛을 한껏 받아 황금빛으로 불타오르는 선채가 조심스럽게 항구로 미끄러진다. ‘썬-크루-즈-’ 파수꾼의 긴 호명은 배의 도착을 항구 전체에, 아니 마을 전체에 알린다. 한달,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저번, 와이트를 떠난 지 정확히 27일 만에 다시 돌아오는 상선 썬크루즈. 썬크루즈를 맞으러 사람들이 부두로 향한다. 그리고 그 일단의 무리에서도 가장 앞에는, 멀리서도 뚜렷하게 보이는 붉은 머리카락을 흩날리는 라메나가 있다.
“리아베-, 리아베-”
“아하하하, 라메나.”
“리아베!”
“라메나, 잘 있었어?”
“리아베...”
떠오르는 아침 해를 정면으로 마주한 선수상이 눈부시다. 떠오르는 태양을 모티브로 바다의 부서지는 파도와, 그것을 헤치고 고개를 내미는 태양을 형상화 해 만들어진 ‘태양의 선수상’은 배 끝에 매달린 하나의 태양인 듯 하다. 그리고 그 부서지는 밝은 빛 아래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일로 활기차다.
“리아베-!”
“아, 네 일항사님! 하역작업을 돕겠..”
“크하하핫, 됐다 됐어. 한 달 만에 만난 애인인데, 그냥 들어가 놀아. 내가 일하라고 했다간, 라메나가 망치를 던질 것 같은걸? 이봐 이봐, 째려보지 말라고. 크하핫”
“아, 넷! 일항사님.”
“크하하, 어서 가보게.”
라메나의 집은 와이트의 동쪽 끄트머리. 와이트엔 대장간이 3개나 있지만, 농기구와 각종 일용품을 만들어 주는 대장간은 라메나의 대장간 뿐. 그래서 항상 손님들로 북적거리지만, 썬크루즈가, 리아베가 돌아온 날은 그렇지 않다.
“리아베, 이번 항해 어땠어?”
“이번엔 말야, 세들레스에 갔는데, 우리 캡틴이....”
리아베가 돌아오는 날은 휴무. 마을사람 대부분이 라메나와 리아베의 사이를 알고, 라메나의 성격을 알기에, 그날은 라메나의 집을 찾지 않는다.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는 법. 정말 바쁜 사람들은 라메나의 대장간 문을 열어젖힌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바쁘면서..
“이봐, 라메나-. 내 연장이 부러졌는데 말이야,”
콰앙! 턱, 턱, 턱.
“아, 아니. 다..다음에 오지.”
.....그러니까 바쁘면서, 아직 라메나가 던진 망치를 보지 못한 사람. 불쌍한 손님의 오른쪽, 겨우 10큐빗 떨어진 곳에 부딪친 후 떨어진 망치위로 톱밥이 우수수 떨어진다. 웃고 있는 사람은 라메나뿐. 이미 익숙한 리아베도 말을 잃어버린다. 등 뒤로 흘러내리는 땀 한 방울. 리아베가 라메나에게 꽉 잡혀 사는 건, 사실 저 망치 때문이 아닐까?
“그..그러니까, 음, 으음. 세들레스에서..”
사랑하는 리아베, 사랑하는 라메나. 썬크루즈가 항구에 머무르는 건 단 3일. 짐을 내리는 날 하루, 새로운 상품을 거래하고 선적하는 하루. 그리고 나머지 보급을 마치고 출발하는 하루. 리아베와 라메나가 함께 있는 날도 단 3일. 그리고 기다림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다음엔 언제 만날지는 라메나도, 리아베도 모른다.
“해...지네.”
“그래, 예쁘다.”
“내일..내일이지?”
“응.”
“언제와?”
“글쎄..”
항구도시 와이트의 일몰은 아름답다. 서쪽바다를 향해 열린 부두. 정말 넓은 부두인데도, 저 한없는 바다와 함께 있으니 너무나도 좁아 보인다. 붉게 물든 서녘하늘은, 붉게 타오르는 태양은 부서지는 파도의 물방울마저도 붉게 물들이려 한다. 철썩, 콰르릉, 싸아-. 날아오르는 바다가 황금빛 눈물을 뿌린다.
“리아베.”
“응?”
“왜 해지는 바다가 붉은지 알아?”
“응?”
“그건 말야.. 바다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태양이, 바다를 만나는 순간만을 기다리다, 그 순간이 오면, 반나절 후엔 헤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이 슬퍼져서 붉게 눈물 흘리기 때문이래. 만나는 바로 그 순간에, 헤어질게 슬퍼져서 말이야.”
“라메나.”
“그래서, 태양의 붉은 눈물이 흘러, 하늘도 물들이고, 저 넓은 푸른 바다마저 붉게 물들이는 거래. 너무 슬퍼서.”
“라메나.”
"기다림은 슬프지 않아."
"그래."
“떠날 거야?”
“떠나야해.”
“그래..그래.”
태양은 인간사엔 관심이 없다. 떠올라야할 그 순간이 오면, 머무르지 않고 떠오른다. 그 태양이 떠오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있어도, 떠오르길 간절히 바라는 사람도 있을 테니.
항구의 아침은 바쁘다. 떠나는 배, 들어오는 배. 배웅하는 사람. 맞이하는 사람. 그리고 빛나는 ‘태양의 선수상’ 아래로, 사랑하는 리아베, 사랑하는 라메나.
“기다려줄꺼지?” “돌아올꺼지?”
“킥킥” “하하하”
바다도, 위대한 바다도 인간사엔 관심이 없다. 어떤 배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 그 배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 부는 바람은 사납다. 굵은 빗방울은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인가? 파도는 무정한 바다의 노한 외침? 하늘을 찟기우는 벼락은 잔인한 하늘의 손길?
‘철썩, 쏴아아-, 철썩, 쏴아- 콰르르릉.’
‘철썩, 쏴아아-, 철썩, 쏴아아-.’
노한 외침은 언제였던가, 다시금 고요히 밝아오는 바다는 언제나와 같은 평온함 뿐. 다만 파도가 밀어주는 부서진 배의 잔해들이 어제의 폭풍우를 말해준다. 떠오르는 태양과, 빛을 잃어버린 ‘태양의 선수상’은 고요한 아침의 항구를 고요함으로 깨운다.
그리고 그 일단의 무리에서도 가장 앞에는 붉은 머리의 라메나가 있다. 고요한 바다 너머를, 그 너머 누군가를 바라보는 라메나가 있다.
“.........................”
“.........................”
항구마을 와이트. 단 한명밖에 없는 여자 대장장이. 그녀가 떠나도 와이트엔 대장장이가 두 명이나 더 있는걸. 산책을 떠나듯 가벼운 걸음걸이엔 남겨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없다.
“가는 거냐?”
“네.”
“어디로?”
“산으로, 산으로 갈려구요, 아니, 산으로 가요.”
기다림은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즐거운 시간. 슬픔이 없는 시간. 하루하루가 기쁨의 시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이 오히려 슬퍼질 만큼.
‘쏴아-, 콰르릉, 철썩. 쏴아-, 콰르릉, 철썩.’
바람은, 친근한 바람은 떠나는 사람에게 축복의 입맞춤을, 눈부신 햇살은 여행자에게 밝은 미래를. 그리고 경쾌한 그녀의 걸음 뒤로 떨어져 부서지는 가느다란 이슬은 기다리던,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눈물?
-----------------------------------------------------------------------------------------
너무 마음에 든 글이라... 다시 수정해서(훗)
이거랑, 다니랑, 한달에 한번씩 달님이- 이 세편이 제일 좋아요.
계속 수정시켜 나갈 생각(헤헷)
댓글 4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311 | [단편]파란지붕 | 케테스 | 2005.03.02 | 4353 |
| 310 | [단편]아마도 미래는 내 손에 | 케테스 | 2005.03.02 | 2973 |
| 309 | [단편]마지막 인사 | 케테스 | 2005.03.02 | 2530 |
| 308 | [상상연작 6회 이미지] [4] | 연緣 | 2005.02.27 | 2113 |
| 307 | the immotal king [3] | Long-Rifle | 2005.02.27 | 2674 |
| 306 | 배신 [1] | 넋 | 2005.02.26 | 2087 |
| 305 | [상상연작 5회] 판도라의 상자 [4] | 네모Dori | 2005.02.04 | 2035 |
| 304 | [장편]겨울이야기 5편 [2] | 케테스 | 2005.01.28 | 2189 |
| » | 기다림(수정) [4] | 네모Dori | 2005.01.20 | 1595 |
| 302 | [상상연작 4회] 다니 [5] | 네모Dori | 2005.01.11 | 1588 |
| 301 | ○●-- 붉은달빛 광이엄마 이야기 --●○ [1] | 잔혹한천사 | 2005.01.11 | 1857 |
| 300 | [상상연작 4회 이미지] [5] | 네모Dori | 2005.01.10 | 2595 |
| 299 | ○●-- 붉은달빛 프롤로그 --●○ [4] | 잔혹한천사 | 2005.01.09 | 1820 |
| 298 | 릴레이리플 시즌5 시작 [20] | 태성 | 2005.01.07 | 2150 |
| 297 | 릴레이 리플 시즌 4-2 [20] | 넋 | 2005.01.04 | 1670 |
| 296 | 아스타로스 전기 -프롤로그- [3] | 고구마 | 2005.01.04 | 1672 |
| 295 | 릴레이 리플 시즌4 [32] | Long-Rifle | 2004.12.28 | 2288 |
| 294 | [상상연작 3회] 약(藥) [3] | 넋 | 2004.12.28 | 1819 |
| 293 | 정령술사&소환술사 - 2 [4] | 악마_애기 | 2004.12.26 | 1697 |
| 292 | [상상연작 3회] 투쟁 [3] | 네모Dori | 2004.12.26 | 2025 |